중세 기독교가 금욕적인 수도원적 기독교라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학문적 기독교다. 중세에는 모든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경건하거나 영적인 것을 원한다면 수도원에 들어가곤 했다. 그때 수도원에 들락날락 했던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오늘날도 기도원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독교를 과학적 학문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혹은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어떤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을 기독교의 수호자로 찬양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 학문적 연구를 위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의 학문적인 운동과 함께 학문적인 대중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들은 특히 신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 현장에서는 언제나 성서 해석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성서 해석에 대한 ‘설’이 존재한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맞는지, 한 시대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이 성서 본문의 저자가 사도인지 아닌지 등 다양한 ‘설’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수’만큼 기독교를 세상에 밀반입할 만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수는 기독교의 전체 관점을 이동시킨 사람이기 때문이다. 행함의 진지함을 학적인 진지함으로 바꾸어 놓은 반역자일 수 있다.
현대 기독교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행위가 빠진 앙금 없는 찐빵이다. 루터가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의’만을 강조했을 때, 그 이후에 행위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학문적인 기독교는 진리에 대하여 고정된 것이 없다. 언제나 말하듯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진리에 관한 한 도대체 고정된 것이 없이 변하기만 한다.
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은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언제든 성서의 해석은 변할 수밖에 없다. 학문적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의심에 영역에 있다. 언제나 새로운 뜻이 있는지 없는지 성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 이런 의미를 찾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 이런 연구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본받음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 바느질을 할 때,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느질을 하게 되는 경우, 아무리 열심히 바느질을 한다 해도, 전체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한다 해도, 그 실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처럼 기독교를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해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본받음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업적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본받음은 기독교의 본질임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학문적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본받음이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적, 반역자와 같다. 그들은 기독교의 수호자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으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자뻑’에 빠져 진리로 돌아오기 힘들 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반역자가 아니다. 무의식적 반역자, 스스로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착각에 빠진 반역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일깨우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간단하다. 바로 본받음이 필요하다. 옛날에 벨사살 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즐기며 ‘자뻑’에 빠진 왕이었다. 자신이 최고라고 착각하며 술과 향락을 보낸 그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본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쓴 글씨를 해석해 준다. 다니엘이 이 글씨의 뜻이 “당신은 저울에 달렸고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단5:27)는 의미라 말해주었을 때,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듯이, 학문적인 연구에만 빠진 자의 얼굴 역시 본받음 앞에서 그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것은 결국 다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모든 연구, 모든 학문성, 기독교를 수호하며 쓴 책과 그 체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매듭이 중요하다. 바느질을 하려면 먼저 매듭부터 짓고 일을 시작한다. 매듭을 짓지 않는 바느질은 허사다.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 마치 이것처럼, 본받음은 기독교의 매듭이다. 먼저 본받음을 확정짓지 않고 출발하는 어떤 학문적인 결과물도 다 허사다. 그 연구를 저울에 달아보면, 언제나 부족함이 발견된다.
중세 수도원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마치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양 바꾸었다는 점에 있었다. 중세 수도원이 이렇게 탈선할 때 루터가 나타나서 ‘믿음’을 제시한 것처럼, 오늘날 학문적 연구에 빠진 ‘교수’가 탈선할 때, 본받음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본받음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요, 첫 번째 매듭이 되어야 한다. 본받음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격이다.

'카리스 아카데미 > 제자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믿음이란? (0) | 2021.10.19 |
|---|---|
| 용서의 짐 (0) | 2020.05.21 |
| 온유 리더십 (0) | 2020.05.21 |
|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온유 (0) | 2020.05.21 |
| 믿음은 실제로 산을 옮기는가? (0) | 2020.0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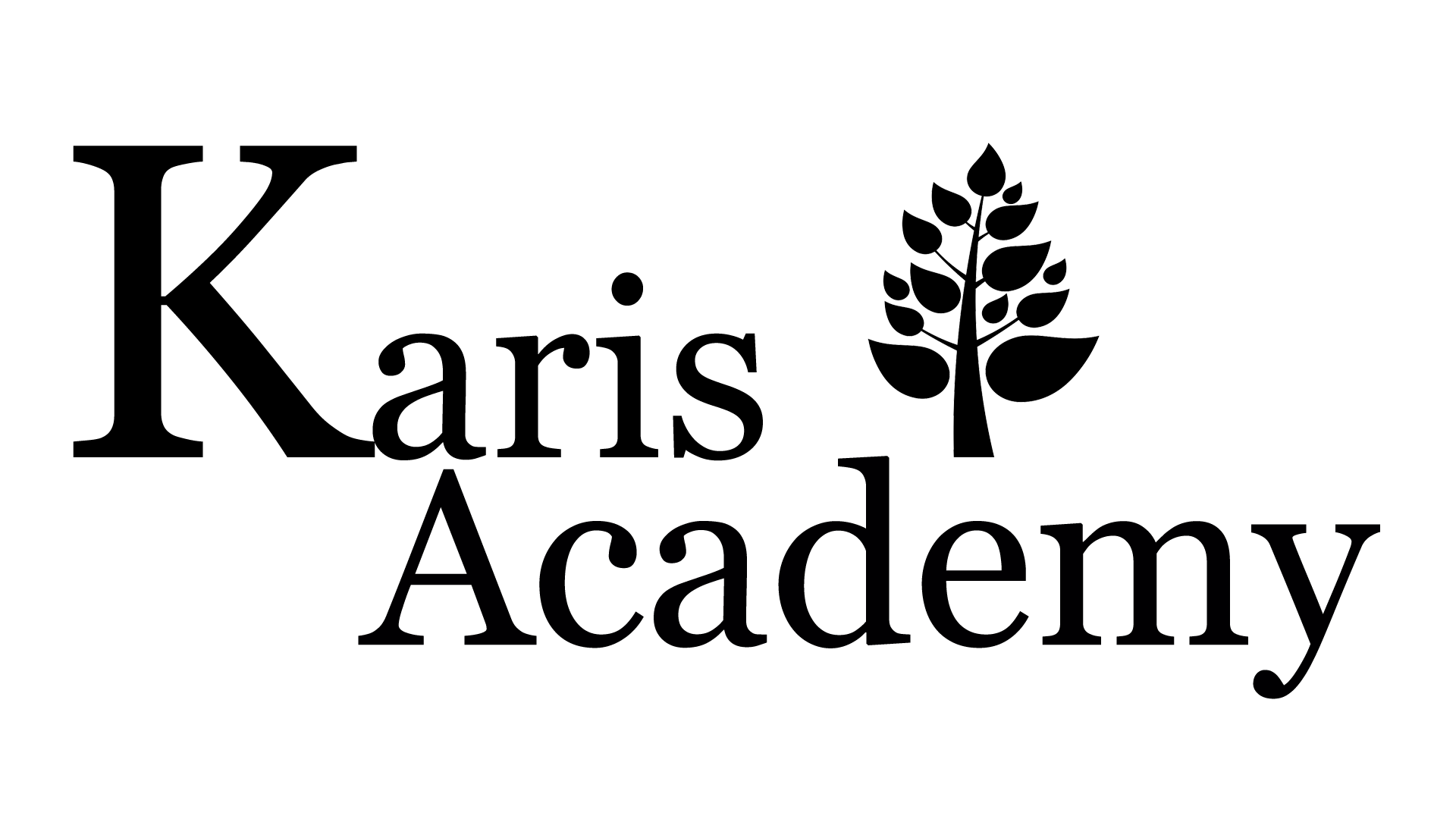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