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의 철학적 출발점—즉 놀라움(Forundring)과 의심(Tvivl)
◄ “저 고귀한 현자(hiin ædle Vise) … 놀라기 시작했다(begyndte at forundre sig)”:
이 표현은 소크라테스를 가리킨다. 플라톤의 대화편 ≪테아이테토스(Theaitetos)≫ 155d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으로, 놀라움(θαυμάζειν)은 지혜의 친구에게 고유한 상태이며, 철학의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놀라움이다.”(덴마크어 번역: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고유한 것은 놀라움이다. 철학에는 이 외에 다른 어떤 시작도 없다.”)
— 이 문장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의 독일어 번역본 Platons Werke 제3권(1818년) 212쪽,
또는 Platons Skrifter 제6권 111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K의 『Søren Kierkegaards Skrifter』 19권 211쪽, 주석 7:21 참조)
▶️ 이어지는 표현: “의심으로 시작하지 않았다(ikke begyndte med at tvivle om Alt)”는 철학사에서 유명한 라틴어 격언인 “De omnibus dubitandum est”—“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를 겨냥한 것이다. 이 문장은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자연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에게서 유래한다.
그의 주저인 ≪철학의 원리(Principia philosophiae)≫(1644)의 제1부 제1절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Veritatem inquirenti, semel in vita de omnibus, quantum fieri potest, esse dubitandum.”“진리를 탐구하려는 자는 일생에 한 번쯤은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
이 문장은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 즉 모든 명제를 체계적으로 의심함으로써 확고한 인식의 토대를 세우고자 한 방법적 회의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이 격언은 헤겔의 철학사 강의에서도 인용되며,
키르케고르에 의해 이미 1842–43년에 쓰인 미완성 저작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또는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Johannes Climacus eller De omnibus dubitandum est)≫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원고 참조: Papir IV B 1)
또한 이 격언은 19세기 덴마크 헤겔주의자들—특히 H.L. 마르텐센과 J.L. 하이베르그—에게 자주 인용되고 논의되었다.
예컨대 마르텐센은 그의 비평문
≪1834년 11월부터 시작된 왕립 군사학교의 논리학 강좌 서론 강연(Indlednings-Foredrag til det logiske Cursus)≫에 대한 서평(≪문예 월간지(Maanedsskrift for Litteratur)≫ 제16권, 1836년, 51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의 철학 표어는 이렇다: ‘의심은 지혜의 시작이다.’”
또한 하이베르그는 그의 철학 잡지 ≪페르세우스(Perseus)≫—사변적 이념을 위한 저널 제1호(1837년 6월)와 제2호(1838년 8월)—에서, “로테(Rothe) 박사의 삼위일체와 화해론에 대한 서평(Recension over Hr. Dr. Rothes Treenigheds- og Forsoningslære)”이라는 장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35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심은 철학적 체계의 출발점이며, 그 점에서 또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 핵심 요약:
• 소크라테스: 철학의 시작은 놀라움(θαυμάζειν, forundring) — 진리를 향한 열림.
• 데카르트: 철학의 시작은 보편적 의심(De omnibus dubitandum est) — 확실성을 위한 철저한 회의.
• 키르케고르: 철학이 의심으로 시작한다고 믿는 현대 철학자들에 대해 비판적. 그는 소크라테스의 경외심 어린 놀라움과 실존적 겸허함을 진정한 출발점으로 회복하고자 함.
'책소개 >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선택은 왜 제거할 수 없는 선인가? (0) | 2025.04.30 |
|---|---|
|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제3장 창백한 추수꾼 해설, 219쪽 (3) | 2025.04.30 |
| 무가 됨으로써 예배하는 자 되기, 149쪽 해설 (0) | 2025.04.09 |
| 우리가 기다리는 것, 148쪽 해설 (0) | 2025.04.09 |
| 사람이 몸에 대하여 가장 완전하게 말한 이방인, 147쪽 (0) | 2025.04.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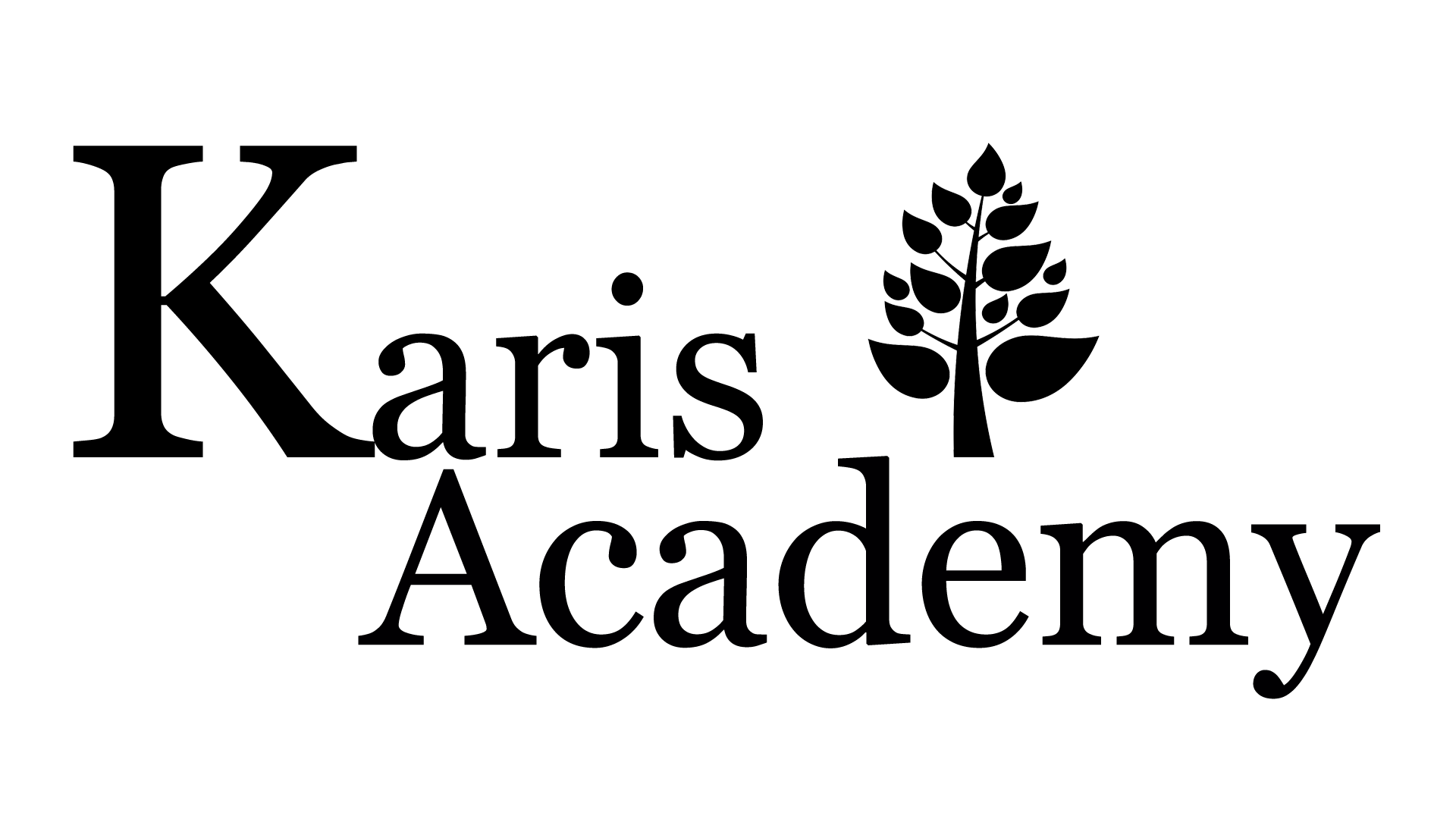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