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틴어 원문 및 번역
Veritas est index sui et falsi → 진리는 자기 자신과 거짓을 드러내는 기준이다.
🔹 철학사적 배경
이 표현은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에게 자주 귀속되며, 특히 그의 ≪윤리학(Ethica)≫ 제2부 정리 43의 주석(annotatio)에서 비슷한 사유가 나타납니다. 해당 정리에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전개합니다:
“진리의 표지는 진리 자체 안에 있으며, 진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할 뿐 아니라, 동시에 거짓과 오류를 식별하게 한다.”
또한 이 문구는 단지 스피노자만이 아니라, 근대 철학 일반, 특히 인식론적 합리주의 전통 안에서 널리 쓰인 표현입니다. F.H. 야코비(F.H. Jacobi) 역시 ≪스피노자의 학설에 대하여: 모세 멘델스존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 이 표현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며, 진리에 대한 인간 인식의 관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 키르케고르의 문맥에서의 해석
키르케고르는 이 문장을 단순한 인식론적 명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실존적 진리의 폭로적 성격을 말하기 위해 끌어온다. 즉, 진리는 단순히 ‘참’이라는 속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인간 실존 속에 들어와 참된 자기 자신과 거짓된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힘을 지닌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진리는 그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안에서 드러낸다.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진리란 단순한 개념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적 인식이다.
따라서 이 문구는 그의 실존철학 전반, 특히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중요한 신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 진리는 자신이 진리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 자신이 거짓과 잘못된 상태에 있는 존재임도 폭로한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신학적 역설로 이어진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즉 절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실존적 고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 성경적 연결
이 개념은 요한복음의 진리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요한복음 3:20–21 (개역개정)“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구절은 진리의 자기증명성과 함께, 그 진리가 거짓을 폭로하는 기능을 말한다. 진리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드러내고, 심판하며,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키르케고르가 이 문구를 끌어와 “진리의 고집(sandhedens rethaveri)”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정리
| 구분 | 내용 |
| 문구 | Veritas est index sui et falsi |
| 번역 | 진리는 자기 자신과 거짓을 가리키는 기준이다 |
| 출처 | 스피노자 ≪윤리학≫ 제2부 정리 43 주석 및 서신집 등 |
| 키르케고르의 해석 | 진리는 자기 인식을 일으키며, 실존의 참/거짓을 드러내는 힘을 지님 |
| 실존적 의미 | 진리와 만나는 순간, 자기기만은 붕괴되고 절망은 폭로됨 |
| 성경과의 연결 | 요 3:20–21, 요 8:32 등에서 진리는 드러냄과 자유를 동시에 수행 |
“Veritas est index sui et falsi”라는 표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어떻게 실존적·신학적 의미를 가지며, 그 개념이 『결론 없는 비학문적 후서(≪Afsluttende uvidenskabelig Efterskrift≫)』의 ‘주관적 진리(Sandheden er Subjektiviteten)’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죽음에 이르는 병』: 진리는 자기 자신과 거짓을 폭로한다
핵심 명제:
Veritas est index sui et falsi – “진리는 자기 자신과 거짓을 가리키는 기준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인식론적 참/거짓의 구별을 넘어, 진리가 실존 전체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거울이라는 키르케고르의 실존론적 신학을 보여준다.
이 개념 아래서 진리란:
- 참을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 거짓된 실존을 정면으로 폭로하며,
- 그 폭로의 순간을 절망 혹은 회심의 순간으로 만든다.
즉, 진리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진리 앞에서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 2. 『후서』: 진리는 주관성이다 — Sandheden er Subjektiviteten
핵심 명제 (≪후서≫, 2부 2장):
“진리는 주관성이다(Sandheden er Subjektiviteten)”
“진리는 가장 격렬한 내면성의 소유로서의 객관적 불확실성이다.”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철저히 실존적 입장에서 진리를 정의한다.진리는 ‘객관적 사실의 소유’가 아니라,객관적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을 진리에 던지는 열정적 내면성이라는 것이다.
즉,
- 진리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달려 있고,
- 진리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 그 진리에 대해 ‘자신이 어떤 실존을 감수하며 응답하느냐’로 검증된다.
🔷 3. 두 저작의 연결 고리: 진리의 자기폭로성과 실존적 수용
이제 두 저작의 연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죽음에 이르는 병』 | 『후서』 |
| 진리는 자기 자신과 거짓을 폭로한다 (veritas est index sui et falsi) | 진리는 주관성이다 (Sandheden er Subjektiviteten) |
| 진리 앞에서의 실존은 자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시작된다 | 진리는 자신이 그것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
| 진리는 실존을 심판하고 갈라낸다 | 진리는 관계 속에서만 실현된다 |
| 절망은 진리의 부정이며, 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 진리는 단지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
요컨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진리는 실존을 드러내는 빛이고,
『후서』에서는 그 진리에 대해 어떻게 실존적으로 반응할지를 묻는 실존적 결단이다.
그러므로
▶ 진리는 단지 ‘스스로 드러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그 드러난 진리에 대해 내가 누구로서 존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이행한다.
이 점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의 폭로로서의 진리와, 『후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내면성으로서의 진리는 서로 연속된 존재론적 운동 속에 위치한다.
🔷 요약: 진리란 무엇인가?
- 진리는 빛이다 – 모든 거짓된 자아를 폭로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
- 진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내면적 결정이다. (≪후서≫)
- 진리는 외재적 정보가 아니라 내재적 실존을 요청한다.
-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고 살아야 한다.
'책소개 > 죽음에 이르는 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존심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 해설 (0) | 2025.06.26 |
|---|---|
| 2) 영원한 것에 대하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 해설 (2) | 2025.06.26 |
| B 의식의 규정 아래에서 본 절망 해설 (0) | 2025.06.08 |
| 죽음에 이르는 병 모토(기도) 해설 (0) | 2025.06.01 |
| 안티 클리마쿠스 관련 편지 (1) | 2025.06.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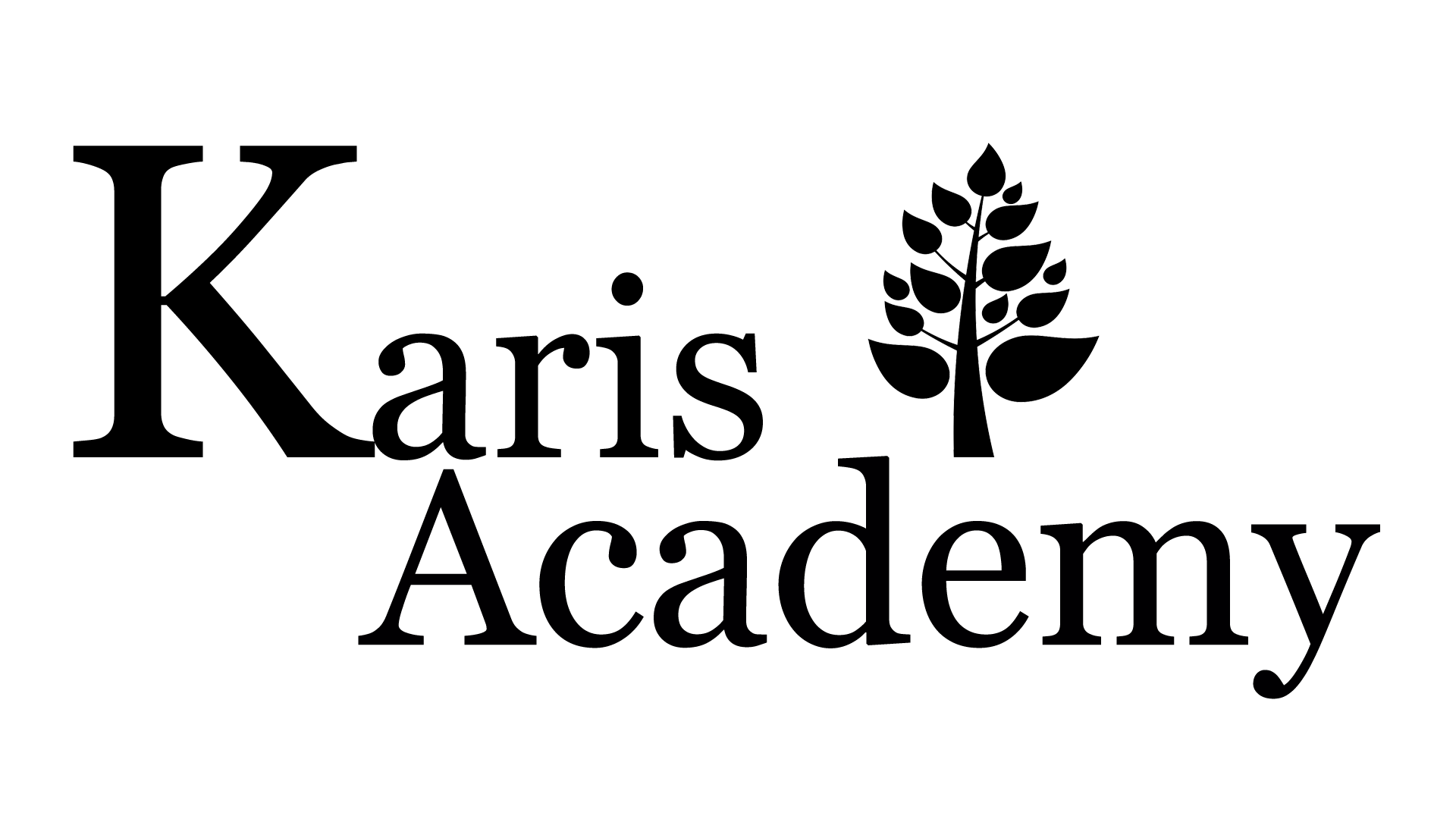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