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유명하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비유이다. 하지만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이렇다. 동굴 속에 죄수들이 손이 사슬에 묶인 채, 동굴 벽을 보고 앉아 있다. 죄수들은 한 번도 동굴 밖을 벗어난 적도 없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이런 상황이라면,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뿐이다.

플라톤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치 동굴의 죄수들의 상태처럼 그림자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으로 원을 그려보라. 정확히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콤파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리면 정확한 원일까?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정확히 선을 나타내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라톤 생각에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원의 이데아(본질)”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을 부정하고 저 이데아의 세상을 꿈 꿀 수밖에 없다. 현실세계는 그림자의 세상이므로 현실을 넘어선 저 세상을 동경해야 한다.
키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2층짜리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1층은 키르케고르의 인생의 3단계 중, 심미적 단계에 해당되고, 1층은 윤리적 단계, 2층은 종교적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키르케고르에게 종교적 단계인 2층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비교하자면, 동굴 밖으로 나오는 세계가 바로 2층인 것이다.
키르케고르의 2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도약”이다. 그에 의하면, “믿음의 기사(knight of faith)”가 되었을 때에만 2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의 작품 <두려움과 떨림>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낳은 자식을 죽이는 것은 비윤리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폐륜이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다면 뉴스로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감행하라고 요구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때 믿음의 시험이란 윤리적인 영역(1층)에 머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2층)의 선택이다. 따라서 이때 믿음의 행동이란 윤리 밖에 서는 운동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 밖에 서는 결단이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된다. 아마 이런 계획을 그의 아내와 상의했다면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도약인 이유는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이런 점에서는 플라톤과 다를 바가 없다. 플라톤이 저 세상에서 이데아를 찾은 것처럼 키르케고르의 이 비유에서도 역시 2층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에게는 2중의 도약이 있다.
첫 번째 도약은 이미 말한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2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다시 결단에 의해 1층과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키르케고르의 생각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적용한다면, 동굴 밖을 나온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을 위해 동굴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과 같다. 하지만 플라톤 사상에서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키르케고르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을 비교하였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초월론적이라고만 해석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학적으로는 바르트가 대표적이다. 또한 키르케고르의 사상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적용한 학자도 있다. 불트만이다. 이는 이런 내재와 초월의 혼동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비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키르케고르의 사상에는 이런 초월과 내재, 혹은 절대와 상대가 공존한다.
'신학과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학문적 후서 (1) (0) | 2020.07.14 |
|---|---|
| 믿음의 도약(1) (0) | 2020.07.14 |
| 칼 마르크스와 키르케고르 (0) | 2020.07.06 |
| 죄책의 현상학 (0) | 2020.06.30 |
| 니체와 키르케고르 (0) | 2020.06.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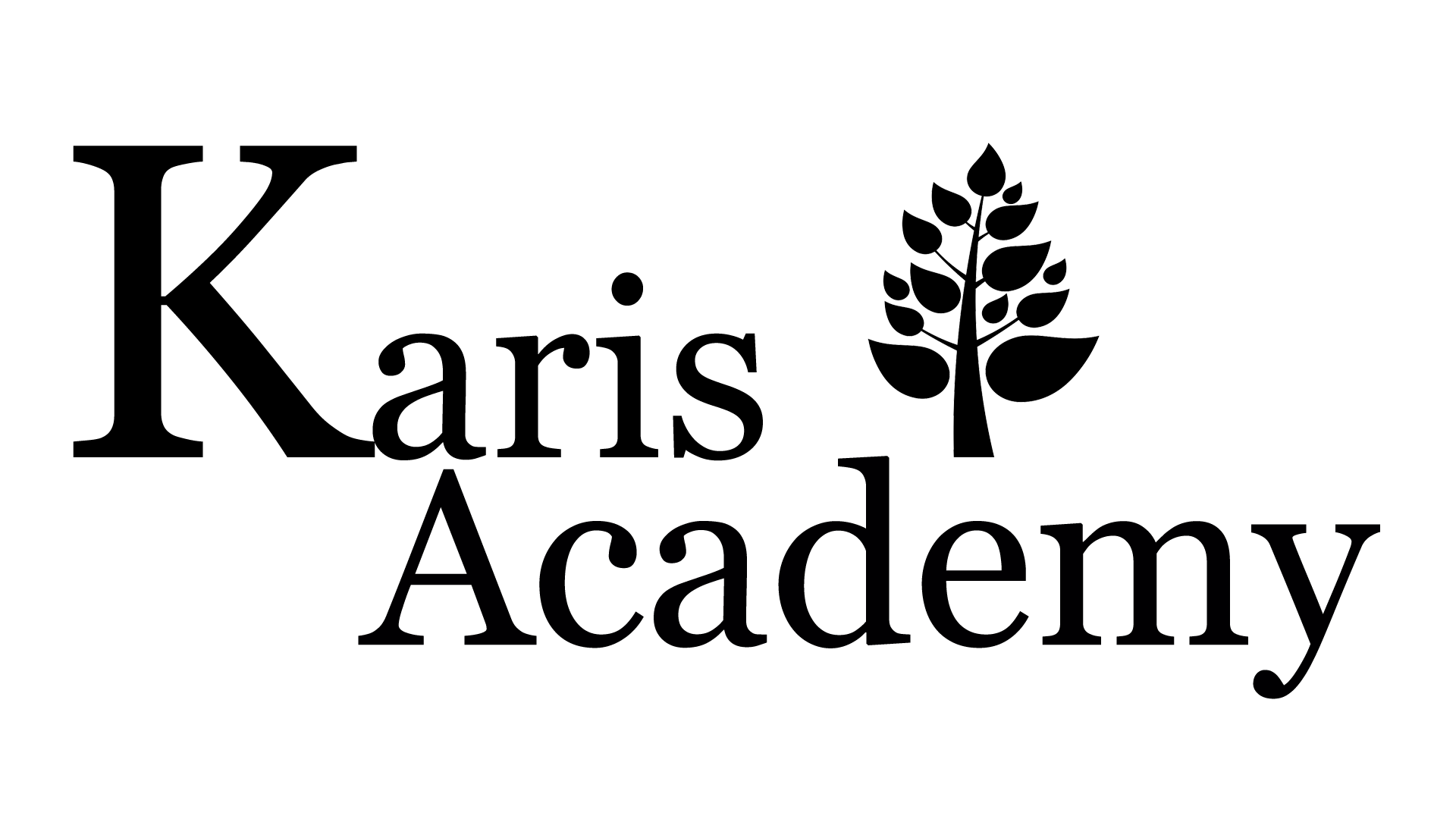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