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annes de silentio: Rhetorician of Silence
By JOAKIM GARFF
Translated by BRUCE H. KIRMMSE
시인의 이름은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이며, 영웅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된 말은 전자가 후자에게 바치는 찬사(panegyric)입니다. 그러나 이 찬사는 단순한 찬사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논리적 함의, 혹은 적어도 논리적 함의와 유사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즉, “만약 ~하지 않았다면(If there were not)“으로 시작하는 문구들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then)“이라는 논리적 결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논리적 결과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의 “그러므로(therefore)“는 더욱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그러므로”가 처음에 제시된 “영원한 의식(eternal consciousness)”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영웅과 시인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의미의 공백—즉, 설명되지 않는 불명확한 열정들—은 바로 이 두 인물, 혹은 그들이 아담과 이브와 공유하는 어떤 것, 즉 서사(epic)와 이야기(story)를 통해 채워집니다.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은 이러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일련의 철학적 성찰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가 그 이야기에 담긴 변증법(dialectic)을 보여주기 위해 “문제 형식(form of problemata)“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를 통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역설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발생하지만, 그 순서는 반대입니다. 제게는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추출해낸 요소들이 그가 그 이야기 위에 덧붙여 전개하는 이야기보다 역설(paradox)로서의 의미가 덜 담긴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들은 인식론(epistemology)보다는 오히려 서사(narrative)와 수사(rhetoric)의 영역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The Individual, the Universal, and the Paradox of Faith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그의 문제(problemata)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탐구하며, 이 모든 부분은 윌리엄 판사(Judge William)가 취한 입장에 대한 파괴적인 반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판사가 심미적(aesthetic)인 것과 윤리적(ethical)인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시도한 개별 요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화해(conciliation)를 향한 그 자체의 욕구에 대한 비판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화해 불가능성(irreconcilability)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치 지향과 신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가치의 재평가(divine revaluation of all values) 사이의 거리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따라서 그는 일관되게 중심을 향한 인간적이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의지를 비판하며, 화해를 시도하는 윌리엄과 중재적(mediating)인 헤겔 모두 그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의 서문에서 제시된 견해에는 그들도 분명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보편자(the universal)와 개별자(the individual) 사이의 관계를 개별자가 보편자에 종속(subordinated)되는 관계로 정의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형태로 선과 악(good and evil)이라는 근본적인 대립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편자는 자기 안에 내재적으로 머물며, 자신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자신의 목적(telos)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자신 밖의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자와의 관계 속에서 개별자의 윤리적 과제(ethical task)는 끊임없이 보편자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개별성을 소멸시켜 보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윌리엄 판사, 헤겔, 그리고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 모두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자신의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만약 개별자가 보편자에 종속된다면, 보편자는 원칙적으로 최종 목표(final goal)와 동일해지며, 이는 보편자가 개인의 영원한 구원(eternal salvation)과 같은 본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만약 개인이 영원한 구원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이는 믿음(faith)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별자가 보편자보다 더 높다“는 역설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자는 절대자(the Absolute)와 절대적인 관계(absolute relation) 속에 서게 됩니다.
선과 악을 넘어, 믿음(faith)은 윤리적(ethical)인 것의 중단(suspension)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믿음이 자신이 속한 역사적 시대에서 비롯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로부터 동기(motive force)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판사와 헤겔을 다소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의무는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의무가 되지만, 그 의무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 만약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나는 단순히 동어반복(tautology)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히 추상적인 의미에서 신성(the divine), 즉 보편자(the universal), 즉 의무(duty)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윌리엄 판사에게 마치 훗날 마르크스(Marx)가 헤겔(Hegel)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논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판사가 보편자를 기준으로 정의했던 의무(duty)—왜냐하면 보편자는 정의상 윤리적인 것이었기 때문—는 이제 파생된 형태의 의무이며, 따라서 상대적(relative)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나님(God)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문화적 질서(cultural arrangements)의 타당성을 보증하는 궁극적인 보증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영역을 구성하는 원칙들의 근본적인 재구성(radical reconfiguration) 그 자체입니다. 이 점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역설이 소통(communication)의 영역에서 드러날 때 분명해집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는 누구나 “내면성의 범주(categories of inwardness)를 벗어던지고 외부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믿음의 역설이란, “외부와 비교할 수 없는 내면성(inwardness)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내면성(inwardness)은 자신이 보편자(the universal)와의 불일치를 중단하고, 자신을 드러내라는 보편자의 요구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드러냄은 본질적으로 언어적(verbal)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사라(Sarah), 엘리에셀(Eliezer), 그리고 이삭(Isaac)에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고통(distress)과 불안(anxiety)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자(the Absolute)와의 절대적 관계(absolute relation) 속에서, 보편자와 소통(communication)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 역설적인 의무가 형식적으로는 표현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에 따르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 침묵이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의해 역설적으로 동기부여되었다면, 이 침묵은 여전히 역설(paradox), 혹은 적어도 문제(problem)로 남습니다. 그것을 재현하려는 모든 텍스트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게 침묵을 깨지 않으면서 침묵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즉,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하면서도 그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배제된 소통의 영역으로 그를 다시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책의 문제(problemata)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Johannes de silentio: Rhetorician of silence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그의 서문에서 자신과 그의 책을 거리의 파토스(pathos of distance)로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결코 철학자가 아닙니다. 시적이고 우아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보조 서기(supplemental clerk)일 뿐입니다. 그는 어떤 체계(system)도 쓰지 않으며, 체계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체계에 대해 어떤 서약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체계에 묶어두지도 않습니다.”
이 보조 서기(사무 보조원)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 순수하고 단순한 사치(luxury)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글을 사서 읽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것은 더욱 즐겁고 분명한 사치가 된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 내놓는 이 작품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열정(passion)을 지워버리고 학문적 지식(scholarly knowledge)을 섬기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가 자신의 이름에 침묵(silence)을 새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침묵을 주제로 삼은 이 책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침묵, 즉 침묵 속에 존재하는 언어의 부정적 현존(negative presence of language in silence)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단지 침묵으로부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 대하여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텍스트가 확장될수록 함께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텍스트가 확장될수록 침묵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아브라함(Abraham)을 역설(paradox)의 대표자로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침묵이 텍스트의 소통의 영역(communicative realm)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사유와 그 역설의 불가사유성(unthinkability of the paradox) 사이에 거리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는 이를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나는 거대한 트램펄린 도약(the great trampoline leap)을 통해 무한(infinity)으로 넘어갈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내 허리는 곡예사처럼 뒤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브라함을 응시해야 할 때면, 마치 내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보려고 애쓰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마비된다.”
자신의 이름에 침묵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유난히 수다스러운 인물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아브라함의 침묵과 얼마나 부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가 거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완수해야 할 과제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책의 초반부에서 거의 명령형(imperative)으로 제시됩니다. 이 책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술적 상상의 직조(artistic weaving of fantasy)“가 아니라, 사유(thought)의 떨림과 전율(shiver and shudder)입니다.
이러한 명령형(imperative)을 통해 이 작품은 이상주의 전통(idealist tradition)에서의 숭고함(the sublime) 개념과의 연결을 선언합니다. 이 숭고함은 계몽적 휴머니즘(enlightened humanism)의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에 침입하며, 단순히 심미적(aesthetic)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개인을 아름다움(beauty)과의 평온한 관조적 관계를 깨뜨리는 강렬한 인상(impressions)과 마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숭고함의 이질성(alien character)—혹은 그것이 상상력(imagination)에 가하는 거의 폭력적 효과(violent effect)—는 개인을 두려움(fear)과 떨림(trembling)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Kant)가 명확하게 주장했듯이 그 위험은 실제로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숭고(the sublime)는 어떤 형태의 재현(representation)도 피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너머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이질적인 것(alien)에 대한 두려움은 이성(reason)이 감각적 세계가 예상치 못하게 드러낼 수 있는 혼돈(chaos)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리 두기(distancing) 할 수 있는 화해적 능력(conciliating capacity)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찾아옵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가 “사유의 전율과 떨림(the shiver and shudder of thought)“을 요구할 때, 그는 이성이 화해하지 못한 숭고함, 즉 여전히 이질적이고(alien) 공포스러운(terrifying) 존재, 사회적·철학적 중심을 거부하는 재앙(calamity)을 떠올립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경고받듯이, “아브라함은 매개될 수 없다(Abraham cannot be mediated)“는 점 때문입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을 두고 눈물 흘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Mount Sinai)에 다가갔듯이, 우리는 그에게 종교적 공포(horror religiosus)로 다가간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알고 있고, 따라서 그 위험이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단지 시험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공포(religious terror)가 아니라, 화해적인 지식(reconciling knowledge)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때 산(Mount Moriah)으로 나아갈 때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을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안이한 지식은 반복적으로 비판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더욱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극적 상황(dramatic tension)을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설(paradox)에서 세속적 지혜(worldly wisdom)를 빨아들이기 위해 적절한 역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는 결국 아브라함의 고뇌와 역설을 안전한 관찰의 거리에서 바라보게 하여, 그 이야기에 담긴 진정한 공포와 떨림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비록 이 작품의 명령(imperative)이 반심미적(anti-aesthetic)인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사유의 전율(shudder of thought)이 모든 형태의 명확한 재현(clear representation)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오직 명확한 재현의 매체를 다시 설정하는 심미적 실천(aesthetic praxis)을 통해서만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극적으로(dramatizes) 재현합니다. 그는 모리아 산(Mount Moriah)으로 가는 여정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도살(butchery)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독자에게 사유의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현존의 감각 혹은 직접적 앎(personal knowledge), 즉 검시(autopsy)를 기반으로 하는 글쓰기와 함께합니다.
작품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공포(terror)를 지속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점은 서문 바로 뒤에 나오는 “조율(Mood)”이라는 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네 가지 변주(four variations)가 제시되며,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어 공포의 전율(shuddering return of terror)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윤리적 것의 목적론적 중단(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이 시간의 심미적 중단(aesthetic suspension of time)과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검시(autopsy)입니다. 시간(time)은 텍스트가 방어해야 할 위협(threat)이며, 텍스트는 이를 마치 “수천 년(millennia)이 엄청난 거리인 것처럼” 심미적으로 회피(abjure)하려고 시도합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예술적 상상의 직조(artistic web of fantasy)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섬유(texture)는 전율(shudder)을 일으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는 아브라함(Abraham)이 재현(representation)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아브라함) 안으로 내 자신을 사유 속에 넣을 수 없다. 내가 절정(high point)에 도달하면 떨어지게 된다(fall down). 왜냐하면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역설(paradox)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종교적 공포(religious terror)로 다가가야 하듯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이 텍스트 또한 스스로 쓰여질 수 없음을 끊임없이 배신(betray)하는 텍스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는 본래 텍스트가 아닌, 역설적인 행동(paradoxical action)에 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이 텍스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다면, 먼저 나는 시험의 고통(pain of trial)을 그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거머리(leech)처럼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불안(anxiety)과 고뇌(distress)와 고통(torment)을 빨아들여,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을 묘사하되, 그럼에도 그는 믿었다(believed)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그 여정이 사흘하고도 한나절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렇다, 이 3일 반은 나와 아브라함을 구분하는 수천 년보다 훨씬 더 무한히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이처럼, 3일간의 여정을 다시 이야기하려는 텍스트가 그 재현의 시간을 이야기 속 시간의 역비례로 배열한다면, 그것은 텍스트(text)라기보다는 텍스트와 그 대상(object) 사이의 불일치(misrelation)를 드러내는 시연(demonstration)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무력한 몸짓(impotent gestures)으로 침묵(fall silent)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일련의 텍스트 속 등장인물들(textual characters)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방(mime)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건은 다른 이들에게 전율(shuddering grip)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다른 이들은 그 전율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반복(repeat)하고 재현(reduplicate)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텍스트가 심미적(aesthetically)이고 수사적(rhetorically)으로 만들어낸 비전(vision)과,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가 존재론적(existentially)으로 요구하는 실천(demand)이 동기화(synchronization)되는 방식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반성(reflect)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게 이렇게 외친다.
jam tua res agitur (이제 그것은 너의 문제다.)”
간단히 말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반복(repetition)과 재현(reduplication)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Three Knights of the Order of Faith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유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환상적인 이야기(fantastic stories)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곱 개를 훨씬 넘으며, 거의 일곱 번의 일곱(7×7)에 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 다수는 단순한 환상을 넘어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책에는 매우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 다양한 계급과 질서(order)의 기사(knights)들,
• 아가멤논(Agamemnon), 입다(Jephtha), 브루투스(Brutus)와 같은 영웅들, 이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영웅적 용기(heroic courage)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의 익명의 시민들,
• 그리고 아그네스와 인어(Agnes and the Merman), 토비아스와 사라(Tobias and Sara), 파우스트와 마가렛(Faust and Margaret) 같은 커플들. 이들은 잘 알려졌듯이, 실제로는 커플이 되지 못했기에 커플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특징은, 그들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개되는 더 큰 공간 안에 놓인 작은 이야기의 틈새(narrative niches)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치에 따라, 이들은 우울한 독백(dispirited monologue)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드라마 정의, 그리고 잠시 동안은 침묵(silence)처럼 보일 정도로 조용한 말까지 다양한 논평(commentary)을 내놓습니다.
이러한 논평들은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가 아브라함에 대해 쓰는 본문에 대한 부차적 텍스트(subtext)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마치 프리즘(prism)처럼 기능하여 아브라함 이야기 속 신학적(theological), 철학적(philosophical), 심리학적(psychological) 문제들을 굴절시키고, 이를 개인적으로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등장인물들은 텍스트의 인식론적 함의(epistemological implications)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생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꽤나 고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는 스스로를 “영웅들의 고문관(tortor heroum)“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역할을 세심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마침내 탈출구를 발견할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작은 변화를(a little change)” 만들어 내어 영웅의 상황을 가능하다면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세 인물이 시인에게서 더 부드럽게 다뤄집니다. 사실 마지막 인물은 불확실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고귀한 믿음의 기사(knights of the noble order of faith)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세금 징수원(tax collector)처럼 사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물은 이름도 시민적 지위도 없어서 편의를 위해 각각 “그 남자(that man)”와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라고 부릅니다.
먼저 세금 징수원은 비더마이어(Biedermeier) 시대의 코펜하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적인 믿음의 기사(knight of faith)에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 그는 아브라함(Abraham)처럼 믿음의 이중 운동(double movement of faith)을 행했다는 점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포기했습니다(아브라함이 이삭(Isaac)을 포기한 것처럼). 동시에, 믿음이라는 궁극적이고 불합리한 가능성(absurd possibility)을 통해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으로 다시 이삭을 되찾은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과 세금 징수원 사이에는 엄청난 사회적·문화적 거리(socio-cultural distance)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존재 방식(existential mode)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가 있다.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눈다. 처음 그를 보자마자 나는 그를 밀쳐내고, 심지어 약간 뒤로 물러나 박수를 치며, 작게 말한다. ‘세상에!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맞아? 세금 징수원처럼 생겼는데!’ 그러나 그가 맞다. 나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무한(infinity)으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신호—한 번의 눈길, 표정, 몸짓, 슬픔, 미소—이라도 보이기를 기대하며 지켜본다. 그러나 없다! 나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살펴본다. 그 속에서 무한이 비칠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있는지. 그러나 없다! 그는 완전히 견고한 존재다.”
이 묘사는 믿음의 기사가 겉으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일지라도, 내면에서는 믿음의 역설을 살아가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는 세금 징수원(tax collector)을 집요하게 쫓습니다. 한 거리에서 다음 거리로,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마치 과거에 요하네스 더 세듀서(Johannes the Seducer)가 코르델리아(Cordelia)를 쫓았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를 뒤따릅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의 내면 어딘가에 있을 작은 틈(“tear”)을 찾으려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자신이 놀랍게도 발견한 사실에 당황합니다. 세금 징수원은 교회에 가는 일이나 숲속을 산책하는 일을 똑같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맞는 역할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의 감시를 받는 이 세금 징수원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치 “부르주아(bourgeois)”, “사무원(clerk)”, “사업가(money-making businessman)”, “시인(poet)”, “우편배달부(postman)”, “식당 주인(restauranteur)”, “자본가(capitalist)”, 심지어 “16세 소녀(sixteen-year-old girl)”, “천재(genius)”, “돼지고기 정육업자(pork butcher)”,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do-nothing)”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마치 아브라함의 희생(sacrifice)을 패러디(parody) 하듯—하루가 저물 무렵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특별히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놨겠지. 예를 들면, 채소와 함께 구운 양머리(roast head of lamb with vegetables) 같은 것 말이야.”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세금 징수원이 단순히 부드럽고 평범한 부르주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기사(knight of faith)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호함(ambiguity)이 바로 핵심입니다.
세금 징수원의 역할은 곧 “외부와 비교할 수 없는 내면성(an inwardness which is incommensurable with the external)”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외적인 모습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그 외적인 모습 덕분에 믿음의 기사인 것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러한 변증법(dialectic)을 밝힙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한(infinity)의 운동을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신에 차서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그로부터 유한(finitude)을 얻어냅니다. 단 한 순간도 아무도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그 누구도 세금 징수원의 존재론적 기반을 의심하거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기반은 믿음의 경이로운 체험(wondrous experience of faith)이거나, 혹은 단순한 일상적 순응(everyday conformism)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현재 상황에서 믿음의 체험이라는 전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면서도 동시에 마치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삶의 도약(leap of life)을 산책(walk)으로 변형시키는 것, 숭고함(the sublime)을 평범함(the pedestrian) 속에서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것은 오직 믿음의 기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기적(miracle)이다.”
평범함 속에서 숭고함(the sublime in the pedestrian), 일상 속에서 고귀함(the exalted in the ordinary)을 표현하는 것—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면성(inwardness)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내면성은 그 세상 안에 머물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공식(formula) 자체는 역설(paradox)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숭고함(the sublime)은 분명히 습관적인 삶(habitual life)의 차분한 리듬으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이 역설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원(tax collector)은 자신의 정반대에 가까운 무언가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는 자신의 내면성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mis/relationship)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전적인 지상적 형상은 부조리(absurd)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무한히 포기했고, 그 후 부조리에 의해 다시 모든 것을 붙잡았다.”
이제 세 명의 (선택된) 믿음의 기사(knights of faith) 중 두 번째 인물인 “그 남자(that man)”를 소개할 시점입니다. 그는 책의 첫 부분에서 등장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집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켰고,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두 번째로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나이가 들자, 그는 그 이야기를 더욱 큰 감탄 속에서 다시 읽었다. […] 나이가 들수록 그는 그 이야기로 더 자주 생각이 돌아갔고, 그의 열정은 점점 강해졌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결국 그는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이 구절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네 가지 짧은 변주가 이어지는데, 각각은 “그 남자”가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투영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 과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는 이 사건을 깊이 생각했다. 그는 모리아 산(Mount Moriah)으로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피곤에 지쳐 쓰러졌고, 손을 모으고 말했다.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이는 없었다.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묘사는 “그 남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존재와 믿음의 역설을 이해하려는 존재론적 고투(existential struggle)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야기가 그 남자(that man)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그의 삶에 새겨졌고, 그를 완전히 채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때 그가 속해 있던 현실의 이야기는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와 아브라함(Abraham)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범주(categories)를 넘어서는 검시적 체험(autopsy)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그 내재된 서사적 힘(epic power)에 의해 독자에게 단순히 “읽히는 것”을 넘어, 독자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독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함께 발생합니다. 이 점은 “그 남자”가 모리아 산(Mount Moriah)으로의 여정을 반복할 때마다 극도의 피로(fatigue)로 쓰러진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재현한 검시적 체험(autopsy)이며, 그래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의 다음과 같은 수사적 질문(rhetorical question)이 충분히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될 수 없다면, 그런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애쓸 가치가 무엇인가?”
이러한 현존(presence)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믿음의 기사(knight of faith)에게 도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희생이라는 비전(vision)에 완전히 사로잡혀 눈을 감을 수조차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꽤 조용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희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나도 하고 싶다.”
즉, 그는 그 이야기를 반복(repeat)하거나 재현(reduplicate)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하자마자, 그는 목사(pastor)를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의 계획을 축복(blessing)해주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자여, 사회의 쓰레기여! 대체 어떤 악마가 네게 씌여서 네 아들을 죽이려 하느냐!”
이에 대해 “불면증 환자”는 단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그건 목사님이 일요일에 직접 설교하신 내용 아닌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 짧은 장면에 대해 이렇게 논평합니다:
“희극적인 것(the comic)과 비극적인 것(the tragic)이 여기서 절대적인 무한(infinite) 안에서 맞닿는다. 목사의 설교는 그 자체로도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그것이 초래한 결과로 인해 무한히 우스꽝스러워졌다—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장면은 믿음의 역설(paradox of faith)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과 희극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려는 시도는 사회적, 윤리적 기준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색한 충돌이 웃기면서도 비극적입니다. 결국,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믿음의 역설이 윤리적 체계나 사회적 규범 안에서 결코 이해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의 마지막 주장입니다. 그는 이 상황이 아무리 우스꽝스럽더라도, 그 결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물론,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반복하려 했던 것은, 목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악마에 사로잡혀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야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반복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이야기가 이전의 두 명의 믿음의 기사(knights of faith)처럼 단지 내면적(internal)으로만 반복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external)으로 반복되기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어떤 반복은 정당하고, 다른 반복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위대하고,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것은 죄악이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죄라는 것인가? […] 만약 믿음이 아들을 죽이려는 의지를 거룩한 행위로 만들 수 없다면,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직접적인 행동 의지(will to action)를 가진 “불면증 환자”는 키르케고르의 작품에서 처음으로 내면성(inwardness)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명제를 의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내면성을 행동(action)으로 변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매혹적(fascinating)이어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그 이야기에 짧은 후기(postscript)를 덧붙이고 맙니다:
“그는 아마도 결국 처형되었거나, 정신병원에 보내졌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이른바 현실과의 관계에서 불행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는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현실(so-called reality)”은 바로 윌리엄 판사(Judge William)와 부르주아 속물(bourgeois philistine)이 위치한 사회문화적 체계(socio-cultural system)입니다.
• 윌리엄 판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동일시되어 있고,
• 부르주아 속물은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면증 환자는 이 중재적 체계(mediating system)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결국 비행(delinquency) 또는 광기(delirium)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야기가 그에게 서사적 재료(epic material)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는 반복의 기사(knight of reduplication)로서, 그의 문장(coat of arms)에는 반복(repetition)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동일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가 불면증 환자의 미래를 암시한 지 열 페이지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합니다. 상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한 목사(pastor)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지루하게 설교한 나머지, 회중 전체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오직 “불면증을 앓고 있는 그 개인”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목사가 마침내 열정 없는 설교를 마치자, 불면증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 그 문제를 깊이 명상(meditate)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하자마자, 목사는 다시 나타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 비참한 자여! 네 영혼이 어찌하여 그런 광기에 빠져드는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불면증 환자는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그게 목사님이 지난주 일요일에 설교한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단순하고 미묘한 논리에 따라,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무의미한 존재(nullity), 환영(phantom), 또는 단순히 주의를 돌리기 위한 장식물(decoration)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죄인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서 잘못될 수는 없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가 이러한 변호(defense)를 펼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면증의 기사(the insomniac knight)는 단순한 우연한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검시적 체험(autopsy)의 직접적 대표자입니다. 즉, 그는 이야기 속 이미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본 사람은 다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면증(insomnia)은 단순히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종교적 공포(religious terror)에 대한 적절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눈”을 통해 독자에게 다가간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불면증은 곧 순간적인 공포(the moment of terror), 즉 눈 깜짝할 사이(twinkling of an eye)에 찾아오는 종교적 공포의 은유(metaphor)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응시(stare)하는 넓게 열린 눈(wide-open eye)이며, 그 고통(pain)은 수면의 위안(relief of sleep)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잠들지 못한다는 것은 곧 진정한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세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외웠다. 그러나 그 이야기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몇이나 되었는가?”
그러나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는 순간(the moment)—즉 눈 깜짝할 사이(the twinkling of an eye)—를 포착하는 보는 눈(the seeing eye)의 성격을 지닌 동시에, 가시성(visibility)과 드러남(manifestation)의 성격도 지닌 인물입니다. 이 점은 그가 다른 두 명의 믿음의 기사(knights of faith)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인물의 경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결코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유사성(likeness with Abraham)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성(inwardness)을 외부(external)에서 실현하며, 소통의 영역(the realm of communication)을 거부합니다. 이 소통의 영역은 분주한 목사(busy pastor)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 재앙(catastrophe)이 발생했을 것이고, 아들은 도살(slaughtered)되었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텍스트는 목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는 자신이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을 비난하는 위선자(hypocrite)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사의 패러디(pastoral parody)는 한편으로는 제도(institutions)의 중재적 성향(mediating tendency)과,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중도(middle way)와 사회문화적 체계(socio-cultural system)를 거부하는 의지(will) 사이의 거리를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는 기존의 “기성 질서(the established order)”에 대한 철저한 반대(opposition)를 드러냅니다.
»The Category of the Turning Point«
“일반적으로, 만약 시(poetry)가 종교적 측면과 개인의 내면성(inwardness)을 주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들을 다루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책이 끝나기 약 20페이지 전에 각주(note)로 던져진 문장이지만, 충분히 본문에 더 앞서 삽입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은 종교적 측면과 개인의 내면성에 깊이 주목하며,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에 따르면 시가 마땅히 다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를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가 내면성의 비교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of inwardness)이라는 이론으로 인해 스스로를 딜레마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즉, 내면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시적 언어(poetry)가 필요하지만, 시는 표현(exposition)과 외재화(externalization)의 매체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내면성과 깊이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마치 무대 배우(stage actors)처럼 제시하고 관찰합니다. 이들의 자세(postures), 장면(scenes), 그리고 도약(leaps)은 내면성의 척도(scale of inwardness) 위의 서로 다른 단계들을 나타내며, 그는 마치 자신만의 전용 관람석(private löge)에 앉아 그것을 읽어내는 듯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의 이중 운동(double movement of faith)을 따라가며, 그것을 순수하고 객관화된 내면성(pure, objectified inwardness)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운동(movements)을 해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경이로운 일을 행하고, 나는 그를 찬탄함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한 노예이든, 철학 교수이든, 가난한 하녀이든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그 운동만을 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본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결코 속지 않는다.”
여기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인물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들이 믿음의 역설적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이는 그가 내면성의 외재화라는 모순적인 과제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객관적 관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가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속지 않고, 언제나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내면성(inwardness)은 반드시 명확히 읽을 수 있는 대응물(clearly readable correlate)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성은 결코 비교 불가능한 것(incommensurable)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금 징수원(tax collector)”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는 외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내적으로 그리고 비가시적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경우, 만약 오직 “운동(movements)”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단지 코펜하겐을 목적 없이 떠도는 우연적인 인물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점이 “그 남자(that man)”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운동과 그 중요성을 매우 고집스럽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언급한 “오늘날 시인이 자주 자신과 혼동하는 발레 마스터(ballet master)“에 대한 경멸적인 말(derogatory remark)은 다소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무한한 체념의 기사(knights of infinite resignation)”는 그들의 걸음걸이(walk)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대담(light and daring)“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무한의 기사(knights of infinity)”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높이 떠오름(elevation)”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도약에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상(earth)으로 돌아올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며(vacillate) 자신을 드러냅니다:
“공중에서 그들을 볼 필요는 없다. 그들이 지면에 닿아 접촉하는 바로 그 순간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반면, 도약 자체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 즉 “도약 중에 그 위치를 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사(knight of faith)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성은 “척도(scale)“를 통해 명확히 읽혀집니다.
영웅의 고문관(tortor heroum)으로서,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시적 개성(poetic individualities)”을 불러내는 데에서 기쁨(zestful pleasure)을 느낍니다. 그는 그들을 극한(extremity)의 지점에 붙들어 두기 위해 변증법(dialectic)의 힘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절망의 채찍(whip of despair)을 휘두르며, 희생자들이 그들의 불안(anxiety)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가혹한 방식 뒤에는, 인간은 극적인 반전(dramatic reversal)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본질(true essence)을 깨닫는다는 그의 이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레싱(Lessing)에게 “기독교적 드라마(Christian drama)”라는 발상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시학(Poetics)에서 드라마와 연결된 두 개념, 즉 페리페테이아(peripeteia, 전환)와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 인식)를 언급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과 연결하여,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는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실존적으로(concretely and existentially) 반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즉시 그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야기의 선언인 “de te fabula”(이 이야기는 너에 관한 것이다)와 그것의 명령형(imperative form)**인 “jam tua res agitur”(이제 이것은 너의 일이다) 사이의 거리는, 인식(recognition)과 전환(reversal) 사이의 거리와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극적 전환(dramatic peripeteia), 즉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 또는 “전환점의 범주(category of the turning point)“가 등장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내면성(invisible inwardness)이 갑자기 외부적 행동(external action)을 통해 가시화되는 순간이며, 그 행동은 소통의 영역(realm of communication)을 붕괴시키거나 적어도 위협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처럼, 불면증 환자 또한 “보편자의 영역(sphere of the universal)으로부터 이주한 자(an emigrant)“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물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아이러니(irony)의 형태”를 띤다면, 이는 “내가 무언가를 말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상 아이러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면증 환자가 목사에게 한 대답:
“결국 그건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 아닌가요?”
역시 결코 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불면증 환자는 모두 보편자(the universal)로부터 추방(exiled)되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 아이러니하게 대답합니다. 둘 다 내면성을 외부적이고 극적인 전환(peripeteia)을 통해 가시화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사회문화적 체계(socio-cultural system)의 중재(mediation) 안에서 안식(rest)이나 축복(blessedness)을 찾지 못합니다. 이는 둘 다 보편자의 전제 조건과 요구사항인 연속성(continuity)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과 닮아 있다는 사실은,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의 *이야기 재구성(re-staging)이 아브라함을 심미적 유형학(aesthetic typology) 속에 위치시켰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을 현대의 진정성 위기의 전형적 인물(the character typifying the crisis of authenticity in the modern epoch)로 제시했는지 묻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대답을 구약성경(Old Testament)에서는 보기 드문 아이러니한 말(ironic remark)로 해석하는 것은, 축소된 형태(miniature format)에서 볼 때, 전체 이야기의 재구성(full-scale retelling)이 지닌 특징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22장(Genesis 22)의 이야기가 간결(laconic)할 정도로 사실적(matter-of-fact)이라면,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그의 이야기 재구성에 거대한 실존적 파토스(existential pathos)를 덧붙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에서 아브라함(Abraham)의 구약성경(Old Testament)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도, 그 제목이 신약성경(New Testament) 이야기(엄밀히 말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에서 따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구약의 주제를 변주한 사례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려움과 떨림에서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신약성경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인어(Merman)를 제외하면, 이야기에 그리스도(Christ)는 눈에 띄게 부재합니다. 이 책이 집필되던 시기의 일기에서 키르케고르(Kierkegaard)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다룹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구약은 완전히 다른 범주(categorie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이 바로 목회적 설교(clerical discourse)에서 발생하는 일관성 결여(inconstancy)의 근원이며, 이는 설교에 구약이 등장하느냐, 신약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Johannes de silentio)의 여러 지점에서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죄의 역설(paradox of sin)은 아브라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영역(another sphere)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쯤은 보편자(the universal)의 규범성(normativity)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sin)*를 무시하는 윤리학은 완전히 헛된 학문(futile discipline)이지만, 만약 윤리학이 죄를 고려한다면, 그 순간 윤리학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이러한 통찰은 윌리엄 판사(Judge William)의 윤리학(ethics)에 존재하는 맹점(blind spot)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 자신이 지닌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만약 윌리엄 판사의 공허한 초월성(empty transcendentality)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이,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에 의해 서사적 내용(epic content)으로 채워졌다면, 그가 믿음의 고귀한 기사(knights of the noble order of faith)에게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부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identity)은 본질적으로 한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의 비교적 문제 없는 전이(unproblematic transition)를 전제로 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에 기반합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신화(myths)나 구약성경 이야기(Old Testament stories)에서 나온 동일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Two Perspectives
이제 나는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의 현재 해석에서 제시된 두 가지 관점을 통해 키르케고르의 전체 저작에 대한 관점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두 관점은 내면성(inwardness)의 관점과, 적절한 이름이 없어 전기적(biographical) 관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키르케고르의 내면과 외면의 동일성에 대한 비판은 헤겔(Hegel)을 향한 것입니다. 헤겔은 내면(Innere)과 외면(Äussere)의 교환 관계를 논의했는데, 키르케고르는 이를 처음에는 실존적 문제로 보았고, 이후에는 종교적으로 기반한 내면성과 외적 세계, 즉 보편성(the universal) 간의 갈등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프라테르 타치투르누스(Frater Taciturnus)는 이 갈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교와 관련하여, 외면이 곧 내면이고 내면이 곧 외면이다와 같은 현실의 범주는 전적으로 종교적 사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뮌히하우젠(Münchhausens)들에 의해 발명된 것이다. […] 이러한 문제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옛 속담을 빌리자면, 창문 밖으로 혀를 내밀다가 뺨을 얻어맞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키르케고르는 뮌히하우젠 남작(Baron von Münchhausen)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내면과 외면의 연결성에 의심을 던진 것이 그 자신에게 적지 않은 뺨을 맞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결국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고, 마치 자기 발을 입에 집어넣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키르케고르는 내면성의 냉혹한 수호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리(the tax collector)”라는 유형적 인물을 통해 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내면성의 냉혹한 반대자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저작들은 내면성을 해체해 나가는 정교한 역사로 회고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키르케고르의 저작에서 내면성에서 외면성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클리마쿠스(Climacus)에서 안티-클리마쿠스(Anti-Climacus)로의 변화에서 드러납니다.
이 변화는 각각의 가명(pseudonym)이 제시하는 배경(setting)에서도 반영됩니다.
• 클리마쿠스(Climacus)의 첫 번째 작품은 “배경은 내면성입니다(the setting is inwardness)”라고 선언합니다. 반면, 안티-클리마쿠스(Anti-Climacus)는 “배경은 기독교 사회입니다(the setting is in Christendom)”라고 주장합니다. 안티-클리마쿠스는 『기독교에서의 실천(Practice in Christianity)』의 표지에서 “일깨움(Awakening)”과 “내면적 자기화(Inward Appropriation)”으로 초대하지만, 이 초대는 작품 자체에서 부분적으로 철회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의 실천』이 당시 유행하던 종교적 내면 수용의 방식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성 기독교(Established Christendom)’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성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독교인(true Christians)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겨진 내면성(hidden inwardness) 안에서입니다. 외부 세계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존재는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오, 당연히도, 누군가가 제가 얼마나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알게 된다면, 저는 특별한 명예(honor)와 존경(esteem)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나도 진정한 기독교인이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명예와 존경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숨겨진 내면성(hidden inwardness) 속에 감추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모두 숨겨진 내면성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면성 개념의 해체(undoing of inwardness)는 단순히 신학적(theological), 사회심리학적(social psychological)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것은 전기적 해석(biographical reading)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키르케고르는 “내면(internal)”에서 “외면(external)”으로의 움직임을 묘사함으로써,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결국 그 이면에 있는 인물, 즉 실제 저자인 키르케고르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키르케고르는 단순히 진정한 자아(authentic self)를 드러내고자 시도하는 주체(subject)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표현의 과정에 스스로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르케고르의 저작을 읽는 모든 독해는 처음부터 전기적(biographical) 성향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키르케고르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이 소설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비판합니다.
“작가의 유한한 성격(finite character)의 잔여물이 남아 있으며, 그것이 부적절한 순간에 마치 무례한 제3자나 예의 없는 아이처럼 불쑥불쑥 끼어든다.”
그러나 저는 다소 무례하고, 저 또한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이며 이 비판을 키르케고르 자신에게 되돌려보고자 합니다. 삶과 글쓰기는 단순히 서로 영향(indvirker)을 미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창조(udvirker)해냅니다. 즉, 현실(reality)은 글쓰기(writing)로 전환되고, 글쓰기는 다시 현실로 구현됩니다.
따라서 저는 키르케고르가 피히테(Fichte)에 대해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했던 말을 키르케고르 자신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창조하는 나(producing I)는 창조된 나(produced I)와 동일하다.”
실제로, 키르케고르는 1837년의 일기에서 마치 자기 예언(self-prophecy)처럼 다음과 같은 상황(situation)을 상상합니다.
“누군가가 소설을 쓰고자 한다. 그 소설에서 한 인물이 미쳐간다. 그런데 그는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도 서서히 미쳐가며, 결국 1인칭 시점(first person)으로 끝나게 된다.” (Pap. II A 634)
이러한 상상은 키르케고르의 삶과 글쓰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자아를 묘사하는 작가가 아니라, 그 묘사 과정에 스스로 포함되며, 삶과 작품이 서로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것이다(What I wrote, I wrote)”라는 문장이 여기서는 “내가 쓴 것은 내가 되었다(What I wrote, I became)”로 변형됩니다. 즉, 두 번째로 드러나는 ‘나(I)’는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자아이며, 이는 다소 양가적(ambivalent)인 방식으로, 경험적 자아(empirical I)를 지워내면서 드러납니다. 결국, 키르케고르의 저작 전체는 글을 쓰는 주체가 자신의 구성(construction)과 파괴(destruction) 사이를 오가며 해체(deconstruction)되는 과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키르케고르는 결국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단단하고 자율적인 의미에서 “나(I)”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특정한 의미에서 전기적(biographic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life)과 글쓰기(writings) 사이의 연결(connection)과 분리(separation)를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bio-graphy라는 단어에 하이픈(-)을 추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bio-graphical한 독해는 키르케고르의 저작 속에 잘 알려진 자전적 요소(autobiographical materials)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독해는 키르케고르가 『나의 저술 활동의 관점에서(The Point of View for My Activity as an Author)』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묘사한 방식에서 그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신적] 섭리(Divine Governance)가 나를 양육했으며, 이 양육은 나의 창작 과정 속에 반영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다소 과대망상적(megalomaniac)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자율성(autonomy)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저작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저작물들이 그 자신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이끌림(guidance)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신적] 섭리의 역할(role of [divine] Governance)”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키르케고르의 저작물은 일종의 교양소설(Bildungsroman), 즉 자신의 해체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쓰기는 보다 일반적이고 문자학적(grammatological)인 의미에서 산파술적 관계(maieutic relationship)를 작가 자신과 맺고 있습니다.즉, 글쓰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자신을 무너뜨리고 해체해가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 대한 공격은 단순히 “기성 질서(the established order)”에 대한 교정(correction)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키르케고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명적 복화술(pseudonymous ventriloquism)에 대한 교정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그의 저작들은 개인적인 직설적 행동(personal out-spokenness of action)으로 명확히 전환됩니다.
내면성의 격동(turbulence of inwardness)은 윌리엄 판사(Judge William)가 처음으로 “내면의 역사(inner history)”라는 용어를 도입한 이후 점점 더 극적(dramatic)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내면성은 “수수께끼 같은 돌발성(the suddenness of the enigmatic)”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 표현은 비질리우스 하우프니엔시스(Vigilius Haufniensis)가 죄(sin)의 설명할 수 없는 선행 조건(inexplicable precondition)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내면성은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야(imperatively visible) 합니다.
『순간(The Moment)』의 마지막 호에서 읽을 수 있듯, “결정적인 것(decisive)”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성의 성문(castle door of inwardness)이 오랫동안 닫혀 있다가 마침내 열릴 때, 그것은 스프링 경첩이 달린 실내문의 움직임처럼 소리 없이 열리지는 않는다.”
이 문이 열리는 날은 1855년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키르케고르는 『Fædrelandet』(덴마크 신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지금 『기독교에서의 실천(Practice in Christianity)』을 새롭게 출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명의 이름으로 출간되지 않을 것이며, 세 번 반복된 서문(thrice-repeated preface)도 삭제될 것이다. […] 이전에는 기성 질서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즉, 시적으로(poetically), 따라서 가명으로(pseudonymously) 그것을 비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기성 질서는 전혀 지탱될 수 없으며(untenable), 둘째, 기독교적으로 이해했을 때 기성 질서가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것은 범죄(crime)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grace)를 끌어다 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명(pseudonymity)을 제거하라.” (Pap. X5 B 62, p. 274.)
해석 및 의미
1.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전환
• 키르케고르는 그동안 가명(pseudonym)을 사용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우회적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directly), 행동을 통해(out-spokenness of action)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기성 질서에 대한 강한 비판
• 초기에는 기성 질서(the established order)를 시적(poetic)이고 은유적(pseudonymous)으로 비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기성 질서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결코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존재 자체가 죄악적(criminal)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3. 가명 사용의 철회
• 더 이상 가명이라는 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여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비판과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4. 종교적 책임의 자각
• 키르케고르는 하나님의 은혜(grace)를 빌미로 기성 질서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는 신앙인의 책임과 실천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실천(Practice in Christianity)』은 그 강도 높은 요구 때문에 가명을 통해서만 제시될 수 있었으며, 그 안에는 키르케고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judgment concerning [Kierkegaard’s] own existence)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케고르는 그 가명을 거두어들이는 것(tage igen), 즉 자신의 이름으로 그 가명 저자의 요구를 되풀이(gentage)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판단(judgment)을 내립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서사학적(narratological) 관점으로 본다면,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요구를 반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글 속 등장인물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에서 등장했던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것을 실존적으로(existentially) 반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키르케고르의 저작 속에서 내면성의 불가비교성(incommensurability of inwardness)을 방어한 최초의 인물이자, 자기 실험적 인물(autopsy character)의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역할—즉, 자기 실험의 대표자이자 내면성의 불가비교성의 수호자—속에서 그는 가시화의 인물(character of visibility), 즉 드러남(making manifest)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설적 행동(paradoxical action)이 사회 질서 안에서 끔찍한 불균형(frightful disparity)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1854년 12월 30일에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제목(definitive title)인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There the Matter Rests!)”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뮌스터 주교(Bishop Mynster)를 심판하지 않았다. 아니다. 오히려 나는 [신적] 섭리(divine Governance)의 손에 의해 뮌스터 주교가 스스로를 심판하도록 하는 계기(occasion)가 되었을 뿐이다. 매주 월요일이면, 그는 자신의 일요일 설교를 알아보지 못하거나(recognize), 인정하지 않거나(acknowledge),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거나(dare not) 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고 순진하게도, 나는 월요일마다 그 자신의 설교였기 때문이다. 만약 뮌스터 주교가 세상적인 교활함(worldly shrewdness)으로 자신의 일요일 설교가 요구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존재와 행동에서 자신의 일요일 설교와 동등한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교활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불면증 환자”가 월요일에 목사의 설교를 반복했듯이, “S. 키르케고르”(이 글의 서명)는 1855년의 행동들을 통해 뮌스터 주교의 설교를 월요일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일기 기록은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이러한 되풀이(reduplication)를 자신이 만들어낸 두 인물들과 동일한 파국적 범주(catastrophic category)로 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인물은 기사도의 동일한 계급(knightly order)에 속해 있으며, 키르케고르 자신도 그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질까. 왜냐하면 최근 나는 오로지 이 문제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God’s will)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모든 것을 걸고라도 파국(catastrophe)을 일으켜야 하는 것인지, 체포(arrested)되고, 심판(judged)받고, 가능하다면 처형(executed)되어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 (Pap. XI 2 A 265, p. 267.)
열정 없는 시대(passionless times)는 키르케고르에게 가장 적합했을 “그를 죽게 하라!(per eat)”는 외침, 즉 가장 적절한 박수갈채(applaus)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mismatch)는 관점에 따라 탄식(lament)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조롱(ridicule)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불일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키르케고르의 저작 전체가 그가 1837년에 상상했던 소설(novel)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 소설에서 작가는 장(chapter)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이야기 속에 자신을 새겨 넣고(inscribed), 결국에는 1인칭 단수(first person singular), 현재 시제(present tense), 직설법(indicative mood), 능동태(active voice)로 직접 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떨림』에서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가 사회 질서와는 상충하는 윤리적 중단(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반복하고자 했던 것처럼, 키르케고르도 “불면증 환자”의 세상을 거스르는 무조건적 복종(unconditional obedience)의 의도를 반복(repeat)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소위 현실(so-called reality)과의 관계에서 불행(unhappy)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형(execution)되거나 정신병원(madhouse)에 보내지는 것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행복(happy)했습니다. 키르케고르 또한 소위 현실과의 관계에서 불행했습니다. 그의 희생(sacrifice) 의지를 세상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행복했습니다.왜냐하면 그의 의지(will)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옅은 맥주(thin beer)의 희미한 초안(scanty drafts)으로 남아 있으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 그러니 말하자(This Must Be Said, So Let It Be Said, Then)』의 한 구절에서(이 구절은 너무 많은 것을 말했기에 출판본에서는 생략됨)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행동 뒤에 있는 명백히 개인적이고, 거의 사적인 동기(personal, indeed almost private motivation)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공격이 나에게 가능한 한 최악의 결과로 끝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쓸모없는 희생자(pointless victim)가 되더라도, 나는 말하겠다. 설령 나의 희생으로 단 한 사람도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쓸모없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전혀 아니다.그것은 나 자신에게는 무한한 가치(infinite value)가 있다. 그리고 [신적] 섭리(divine Governance)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유치한 존재가 아니다.” (Pap. XI 3 B 62, p. 112.)
이제 우리—결과를 알고 있으며, 서사적 관점에서 볼 때 순교(martyrdom)가 이야기에서 다소 불운하게 사라진 것을 아는 우리는—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키르케고르의 이야기가 실패(fiasco)로 끝났고, 그의 마지막 장이 역사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고 결론 내려야 할까요? 그 결과로 그는 “세계의 발전(the development of the world)”이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희생자(ironic victim) 중 한 명이 되었을까요? 혹은, 반대로, 우리는 서사의 요구(narrative requirement)를 거부하고, 대신 키르케고르의 역설적인 무력함에 대한 의지(paradoxical will to powerlessness)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지점(true point of deviation)이며, 이 점에서 우리는 클리마쿠스(Climacus)와 의견을 같이해야 할 것입니다.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의도(intention)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의도는 세계사(world-historical)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SV3 9,129.
그리고 그렇기에, 그것은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story about this history)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서 제시된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bio-graphy에서 bios와 graphē 사이의 조용한 작은 하이픈(-)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하이픈은 분리(separation)와 결합(union)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키르케고르의 삶(bios)이 그의 글쓰기(graphē) 속에서 변형(transfigured)되었다는 사실이 그 글쓰기가 그의 삶과 완전히 일치(completely congruent)했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reality), 즉 거리(street)와 세상의 더 큰 이야기(the larger story of the world) 속에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글 속에 새겨 넣은 이야기의 논리와는 양립할 수 없는 논리의 희생자(victim)였습니다. 반면, 종이 위(paper), 글쓰기(writing), 그리고 그의 저작들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창조하는 나(producing I)는 창조된 나(produced I)와 동일하다”는 말처럼(SV3 1,285), 키르케고르는 “불면증 환자(the insomniac)”가 되었고, 특히 되풀이의 기사(knight of reduplication)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그는 bios와 graphē를 동시에 연결하고 분리시키는 하이픈(-)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념을 왜곡하거나 값싸게 만들지 않고 말하자면, 내 삶은 일종의 순교(martyrdom)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순교다. […] 자, 오라! 역사(History)여, 너의 감사(audit)를 시행하라.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여 있다. 게다가 나는 자발적으로 이 위험을 감수했다. 이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다. (Pap. XI1 A 484, pp. 375-376)
이러한 키르케고르 이야기의 역사적 감사(historical audit)와 함께, 저 역시 그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감사(audit)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해석 및 의미
1. 삶과 글쓰기의 긴장
• bios(삶)와 graphē(글쓰기)는 서로 연결되면서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키르케고르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야기의 논리와는 다른 사회적 논리 속에서 희생자였다.
• 그러나 저작물 속에서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변형했습니다.
2. 되풀이의 기사, 실존의 반복
• 키르케고르는 글 속 인물인 “불면증 환자”처럼 실존적 반복(reduplication)을 실천했다.
• 자신의 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풀이하며 실존적 의지를 드러냈다.
3. 역사 앞에서의 당당함
•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형태의 순교”로 받아들였으며,
•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었고, 역사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감당했다.
• 그는 피해자(victim)가 아니라 자발적 실천자(voluntary actor)였다.
4. 삶과 글쓰기의 통합과 분리
• bios와 graphē는 하이픈(-)을 통해 연결되지만,
• 동시에 서로 구분되며,
• 키르케고르는 그 경계를 오가며 삶과 글쓰기를 동일시하거나 구별했다.
결론
키르케고르의 삶과 저작은 서로를 반영하고 형성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형하고, 또한 삶을 통해 글쓰기를 실현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로운 형태의 순교로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역사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과 글쓰기 사이를 오가는 키르케고르의 진정한 실존적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판사(Judge William)는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의 작품 Either/Or (혹은-혹은)에서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로, 윤리적 삶의 단계(the ethical stage of life)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키르케고르가 제시한 세 가지 삶의 단계 중 심미적 단계(the aesthetic stage)를 넘어선 윤리적 단계를 옹호하며, 궁극적으로 종교적 단계(the religious stage)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윌리엄 판사의 역할과 사상
1. 심미적 삶에 대한 비판
윌리엄 판사는 Either/Or에서 심미적 삶을 대표하는 인물인 A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심미적 삶이 쾌락, 미적 즐거움, 즉흥적 삶을 추구하며 삶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결국 절망(despair)으로 귀결된다고 보고,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윤리적 삶을 제시합니다.
2. 윤리적 삶의 강조
윌리엄 판사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려는 노력(becoming oneself)과 의무에 대한 헌신(commitment to duty)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선택과 책임
윌리엄 판사는 인간의 자유를 선택(choice)과 연결 짓습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건 결단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 동일성(selfhood)을 확립합니다.
4. 절망을 통한 성장
심미적 삶이 피상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절망에 빠지는 반면, 윤리적 삶은 절망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윌리엄 판사는 절망을 자기 실현(self-realization)의 중요한 계기로 봅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와의 비교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두려움과 떨림에서 믿음(faith)의 역설을 강조하며, 윌리엄 판사가 추구하는 윤리적 삶을 넘어선 종교적 삶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는 윌리엄 판사의 심미적-윤리적 화해와는 달리, 인간적 가치와 신적 가치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과 역설을 고수합니다. 이는 윤리적 삶을 넘어 믿음의 도약(leap of faith)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의미와 영향
윌리엄 판사는 키르케고르의 존재론적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인간의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와 삶의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현대 실존철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자기 동일성(selfhood)과 개인적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결국, 윌리엄 판사는 윤리적 인간으로서의 이상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종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책소개 > 두려움과 떨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가멤논이 자신이 딸과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려 했는가? (0) | 2025.02.27 |
|---|---|
|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에 대하여 (0) | 2025.01.13 |
|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에 대하여 (1) | 2025.01.12 |
| 두려움과 떨림 소개 (0) | 2025.01.11 |
| 두려움과 떨림의 저자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에 대하여 (0) | 2025.01.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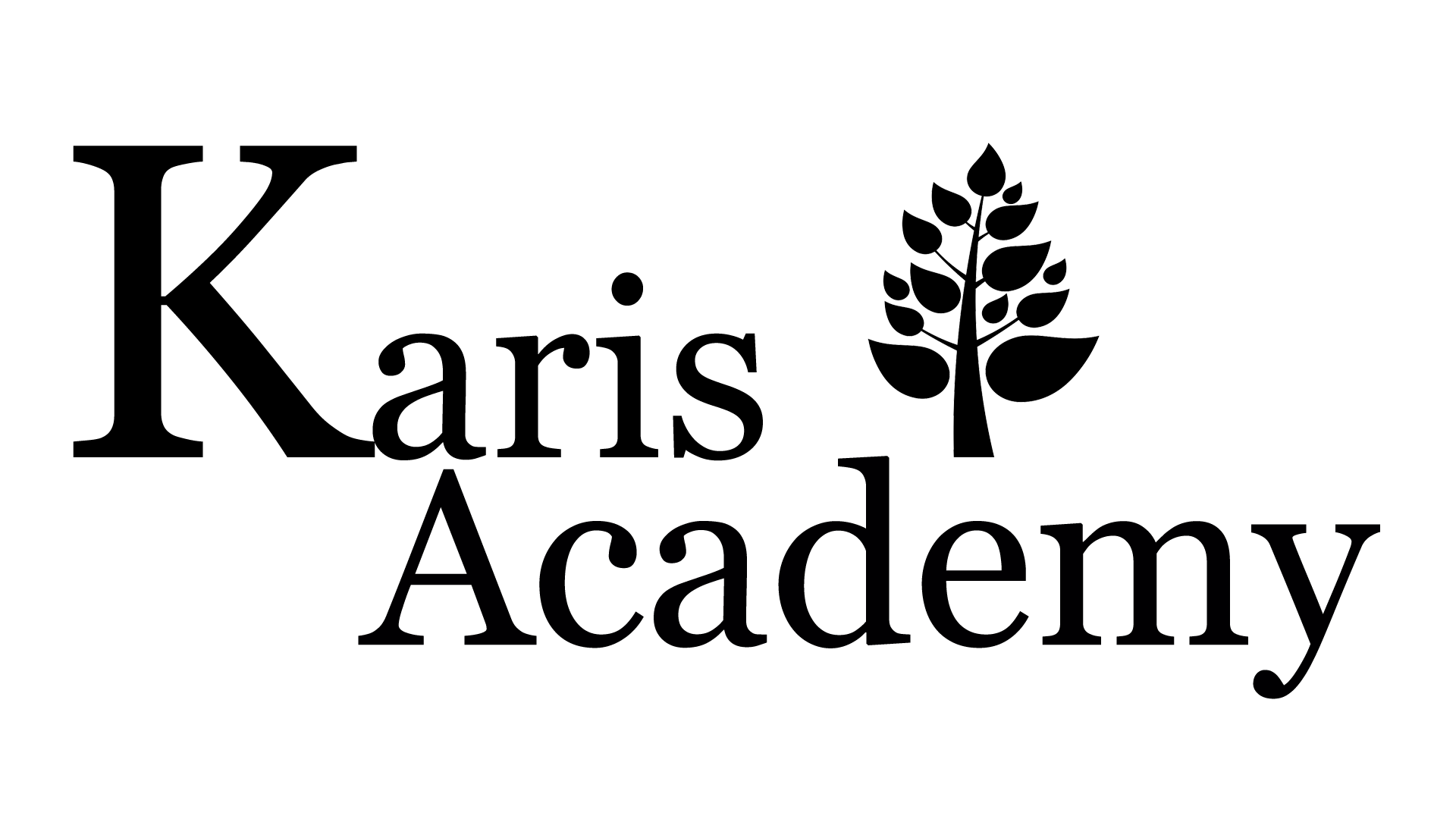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