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선(Gode)”은 단순한 도덕적 선이 아니라, 초월적 선(det transcendente Gode)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Gode)“이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님
키르케고르가 Begrebet Angest에서 말하는 “선(Gode)”은 일반적인 윤리적 선행이나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을 넘어섭니다.
• 선이 X를 드러낸다(Aabenbarelse) → 여기서 “선”은 존재의 깊은 층위를 열어젖히는 힘
• 악마적인 것(dæmoniske)은 선을 두려워한다 → 이는 단순히 윤리적 선악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실존적 구도에서 설명됨
• Aabenbarelse(계시)는 구원의 첫 표현 → 즉, 선(Gode)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구원과 관련된 개념
이러한 점에서 “선”은 단순한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존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실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선(Gode)” = “계시(Aabenbarelse)” = “초월적 개방”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Aabenbarelse(계시)는 단순한 정보의 공개(disclosure)가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닫혀 있던 것이 열리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 X는 미지의 것(Det Ukendte)이며, 존재론적으로 닫혀 있는 것(Det Indesluttede)
• Aabenbarelse(계시)는 X를 드러내는 사건
• 선(Gode)은 X를 드러내는 힘
이 논리를 따르면, “선(Gode) = 계시(Aabenbarelse) = 존재론적 개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은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 실재와 연결된 존재론적·신학적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키르케고르의 “초월적 선” 개념과 기독교적 의미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선(Gode)”은 결국 기독교적 구원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Sygdommen til Døden(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은 자기 자신을 초월적 진리에 개방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 Frygt og Bæven(두려움과 떨림)에서도, 진정한 신앙은 윤리적 범주를 넘어서는 초월적 선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즉, 선이란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넘어, 존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힘이라는 것이 키르케고르의 주장입니다.
4. 결론: 여기에서 말하는 “선(Gode)“은 초월적 선이다
• 선(Gode)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 개방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실재이다.
• X는 존재론적으로 닫혀 있는 것이며, 선은 그것을 계시(Aabenbarelse)를 통해 드러내는 힘이다.
• 따라서 “선”은 인간적 도덕을 초월하는 신적 선이며, 궁극적으로 존재의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다.
결국, “선이 X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진술이 아니라, 초월적 선이 존재를 구원의 가능성으로 개방한다는 존재론적·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키르케고르는 그리스 철학적인 선을 거부한다.
키르케고르는 그리스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선(Gode)“을 거부합니다.왜냐하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의 “선(ἀγαθόν, to agathon)” 개념은 본질적으로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인간 이성으로 인식 가능한 보편적 이데아를 가리키지만, 키르케고르의 “선(Gode)“은 초월적이며 존재론적으로 개방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 그리스 철학의 “선(ἀγαθόν)” 개념과의 차이
| 비교요소 | 그리스 철학적 “선(ἀγαθόν, to agathon)” | 키르케고르의 “선(Gode)” |
| 본질 | 존재의 최고 원리, 형이상학적 이데아 | 존재를 구원의 가능성으로 개방하는 힘 |
| 인식 가능성 | 이성(logos)으로 탐구하고 사유할 수 있음 | 인간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계시(Aabenbarelse)를 통해 드러남 |
| 윤리적 성격 | 선한 삶은 이성을 통해 조화롭게 실현됨 | 선한 삶은 윤리를 넘어선 신앙적 개방 속에서만 가능 |
| 선과 존재의 관계 | 존재의 원리이자 본질적 질서 | 존재를 열어 드러내는 사건적 계기 |
| 대표적 철학자 |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신플라톤주의(Plotinos) |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
플라톤이 말하는 선의 이데아(Idea tou Agathou)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리로서,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의 “선(Gode)“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 사건이며, 오직 “계시(Aabenbarelse)“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2. “선(Gode)“은 플라톤적 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키르케고르는 Begrebet Angest에서 선이 존재를 개방하는 사건(Aabenbarelse)으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플라톤적인 개념과 결정적으로 충돌합니다.
1. 그리스 철학의 “선”은 보편적 형이상학적 질서이지만, 키르케고르의 “선”은 사건이다.
• 플라톤: 선(ἀγαθόν)은 존재의 원형(arché)이며, 모든 것의 궁극적 질서
• 키르케고르: 선(Gode)은 존재를 열어 드러내는 사건적 개념
2. 그리스 철학의 “선”은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키르케고르의 “선”은 계시(Aabenbarelse)로만 인식된다.
• 플라톤: 철학자는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음
• 키르케고르: 인간은 스스로 선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선은 초월적으로 주어진다.
3. 키르케고르의 “선”은 윤리를 넘어선다.
• 플라톤: 선한 삶은 이성(logos)에 의해 조화롭게 실현됨
• 키르케고르: 선한 삶은 윤리를 넘어 신앙 속에서만 가능 (Frygt og Bæven에서 아브라함의 “윤리적 유예 suspension of the ethical” 개념과 연결)
3. 결론: 키르케고르는 그리스 철학의 선 개념을 거부한다
• 키르케고르의 “선(Gode)“은 플라톤적 선의 이데아(ἀγαθόν)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그리스 철학에서 “선”은 형이상학적 질서이지만, 키르케고르에게 “선”은 사건이며, 존재를 개방하는 힘이다.
• 그리스 철학의 “선”은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키르케고르의 “선”은 오직 계시(Aabenbarelse)로만 드러난다.
•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플라톤적 선 개념을 거부하며, 초월적이고 사건적인 “선”을 제시한다.
결국, 키르케고르는 플라톤적 선의 이데아를 완전히 해체하고, 신앙적 존재론으로 “선”을 재구성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f72Dw1VftOk?si=ApS6E189GFZMChVX

'신학과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안의 개념 "계시" 번역어 문제 (0) | 2025.03.17 |
|---|---|
| 키르케고르와 무의식 (0) | 2025.03.17 |
| 조해리 창과 키르케고르의 X개념(불안의 개념 4장) (0) | 2025.03.17 |
| 키르케고르의 이 일기(NB:151, Pap. VIII1 A 39, 1847년)의 의도와 핵심 내용 (0) | 2025.03.11 |
| 키르케고르의 이 일기(NB:73, Pap. VII1 A186)의 핵심 내용과 해석 (0) | 2025.03.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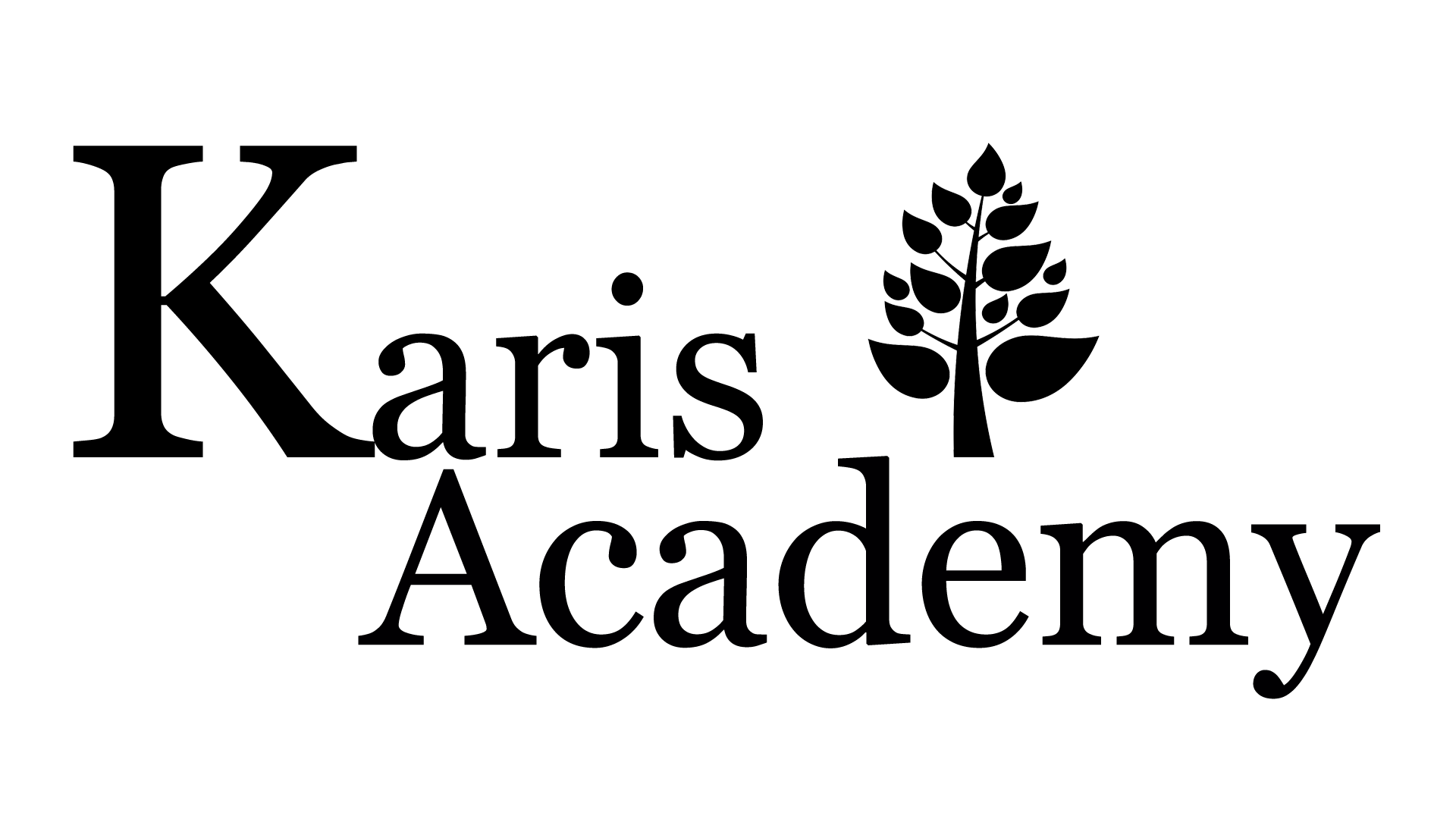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