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서론은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종말론을 담고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절망만이 진정한 죽음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희망이 있다.”
아래는 왜 이 부분이 실존적 종말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입니다:
🕯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종말론: “죽음에 이르는 병”의 문맥에서
1. 전통적 종말론 vs 실존적 종말론
| 구분 | 전통적 종말론 (객관적, 시간적) |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종말론 (주관적, 존재적) |
| 기준 | 역사적 시간의 종말 (죽음, 심판, 종말 사건) | 개인 내면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사건 |
| 중심 | 사후의 세계 / 종말의 시간 |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 |
| 위기 | 외적 재난, 죽음의 공포 | 자기 기만과 절망, 하나님 없는 자기됨의 시도 |
| 해석 | 죽음은 끝 | 죽음은 전환의 지점, 절망이 참된 죽음 |
2.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죽음이 아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 생물학적 죽음은 실존적 종말이 아니다.
키르케고르는 죽음조차 희망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죽음을 한계로 만들지 않는 희망이 됩니다.
- 따라서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 없는 자기’, 즉 절망 상태입니다.
3. 실존적 종말이란?
“자신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 없이 되기를 원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실존의 무너짐이며,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심리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론적 단절, 곧 참된 존재가 생기지 않는 내면적 종말입니다.
4. 기독교적 희망의 역설
“인간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키르케고르는 이 말을 뒤집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죽음 안에 더 큰 희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희망의 역설이며,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 안의 하나의 사건으로 내면화된 종말 속에 포함됩니다.
🔚 결론: 실존적 종말이란
‘죽음’이 실존적으로 문제 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의 고립이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죽음은 실존의 종말이며, 자기의 종말이다.
'책소개 > 죽음에 이르는 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죽음에 이르는 병 해설, 구원 및 종말론 (2) | 2025.05.24 |
|---|---|
| 절망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과 제자도 (0) | 2025.05.12 |
| 죽음에 이르는 병 관련 일기 소개(NB4:161) (1) | 2025.05.12 |
| 죽음에 이르는 병 관련 일기 소개(NB4:160) (0) | 2025.05.12 |
| 죽음에 이르는 병 덴마크어 표지 설명 (0) | 2025.05.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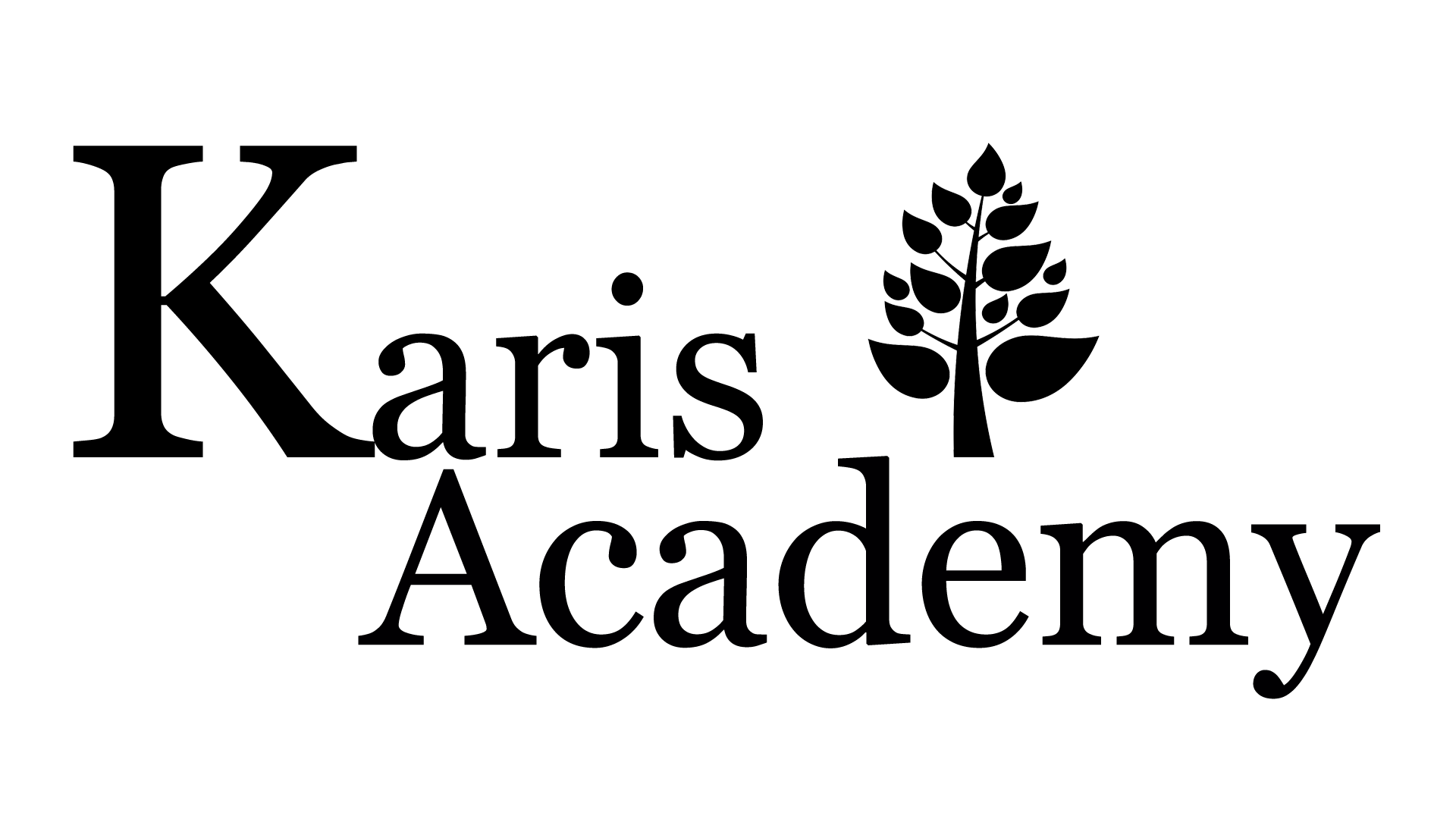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