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스트가 악마와 거래했다는 전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욕망과 궁극적 진리를 자신의 힘으로 도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1. 파우스트의 동기: 무한한 지식과 능력에 대한 갈망
• 초기 파우스트 전승에서 그는 지식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지닌 학자로 등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궁극적 진리나 만족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다.
• 괴테의 Faust에서는 파우스트가 철학, 신학, 의학, 법학을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참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공허함을 느낀다.
• 이러한 절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악마와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2. 악마와의 계약: 신과의 관계 단절
•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와 계약을 맺으며, 세속적 힘과 지식, 쾌락을 얻는다.
• 이 계약의 핵심은 그가 만족하는 순간, 즉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 않는 순간, 그의 영혼이 악마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 즉, 그는 무한한 탐구와 욕망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 하지만, 결국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3. 파우스트의 문제: 신앙과 실존의 역설
• 키르케고르적 관점에서 보면, 파우스트는 ‘신 앞에서의 신앙’ 대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존재이다.
• 그는 믿음을 통한 구원 대신, 자기 확신과 지식을 통해 절대적 진리에 도달하려 한다.
• 하지만 자기 힘만으로 궁극적 진리를 얻으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는 Frygt og Bæven에서 의심(doubt)이 신앙과 대립하는 방식과도 연관된다.
•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신앙의 도약”**을 하여 신과 관계를 맺는다면, 파우스트는 신과 단절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4. 파우스트 전설과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질문
• 파우스트는 실존의 불안과 의심 속에서 악마와 계약했지만,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인물이다.
•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존재의 이중성(Tilværelsens Dupplicitet, 존재의 중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이다.
→ 즉, 세속적으로는 지식을 얻고 힘을 가지지만, 영적으로는 파멸한다.
→ 반면, 신앙인은 세속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는다.
•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한 것은 결국 **“신앙 없는 열정의 결말”**이며, 이는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진정한 실존의 길(신 앞에서의 단독자)이 아닌 길을 상징한다.
즉, 파우스트는 진리를 갈망하지만 신앙을 거부한 인간이며, 그의 악마와의 계약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오만과 실존적 절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Faust. Eine Tragödie)의 결말을 보면, 파우스트는 결국 구원받는다. 이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키르케고르의 Frygt og Bæven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신앙을 통한 도약과 결단에 있음을 강조하지만, 파우스트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고도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1. 파우스트의 구원: 신앙 없이도 가능한가?
•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고, 세속적인 힘과 지식을 탐구하며 자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 그의 목표는 끊임없는 전진과 성취이며, 괴테는 이를 근대적 인간의 이상으로도 묘사한다.
• 하지만 그의 결말에서 신의 은총이介入하여 그를 구원한다.
•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구원의 개념(신앙을 통한 구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파우스트는 신앙의 도약을 하지 않고도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키르케고르의 신앙적 논리와 모순되지 않는가?
2. 파우스트와 『두려움과 떨림』의 차이: 행위로서의 신앙 vs. 끊임없는 탐구
키르케고르의 Frygt og Bæven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앙의 도약”을 통한 관계 형성이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끝까지 신앙의 도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괴테는 파우스트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한다.
✔ 파우스트는 끊임없이 나아가려 했으며, 멈추지 않으려 했다.
✔ 그가 만족하는 순간(즉, 그가 멈추는 순간), 그의 영혼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넘어가야 했다.
✔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전을 추구하며,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인류를 위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다.
괴테는 이것이 신앙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했다. 이러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그를 신적 영역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으며, 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
3. 파우스트의 구원이 키르케고르적일 수 있는가?
만약 Frygt og Bæven의 관점에서 보자면,
파우스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물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신앙의 도약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신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우스트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결국 그를 멈추지 않는 실존적 결단 속에 두었다는 점이다.
✔ 키르케고르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실존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행위로서의 신앙이었다.
✔ 그런데 파우스트는 멈추지 않는 실존적 행위를 통해 결국 초월적인 구원에 도달한다.
✔ 이 점에서 보면, 그의 구원은 키르케고르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존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연결될 수도 있다.
즉, 파우스트는 신앙 없이도 구원받았지만, 그의 삶의 방식(끊임없는 자기 초월)이 결과적으로 신적 질서와 조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4. 결론: 파우스트의 구원과 키르케고르의 신앙
📌 파우스트는 키르케고르적 의미에서 신앙의 도약을 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았다.
📌 그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 했기 때문이다.
📌 이것이 키르케고르의 ‘행위로서의 신앙’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괴테의 Faust는 키르케고르의 철학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존적 태도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실존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신적 질서와 조응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책소개 > 두려움과 떨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두려움과 떨림, 152쪽 해설 (0) | 2025.03.06 |
|---|---|
| 두려움과 떨림 문제 2, 해설 (0) | 2025.03.06 |
| 아가멤논이 자신이 딸과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려 했는가? (0) | 2025.02.27 |
|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에 대하여 (0) | 2025.01.13 |
| 요하네스 드 실렌티오, 그리고 키르케고르 (0) | 2025.01.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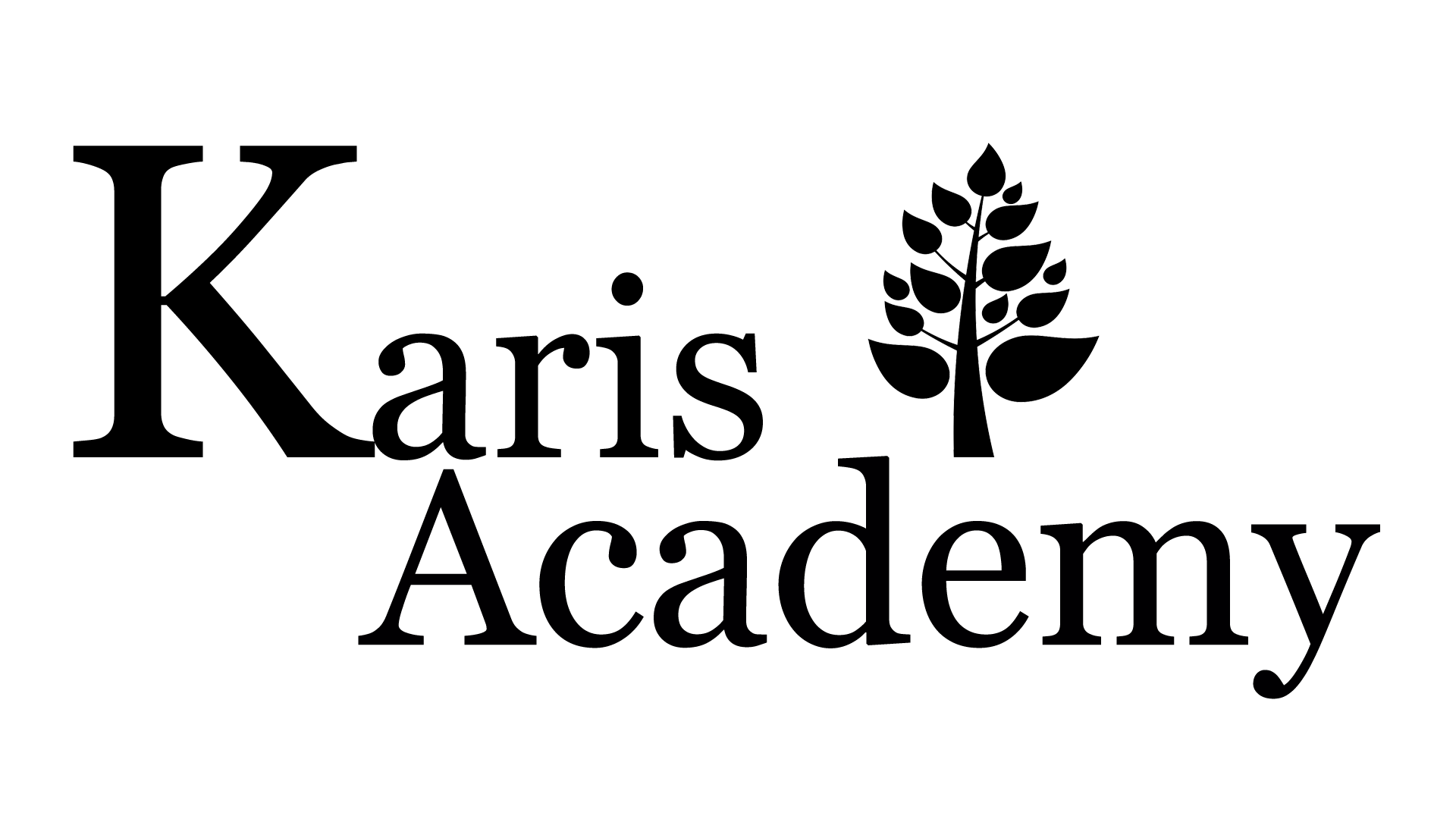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