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B, 실족의 가능성, 영역본 100쪽
◄ man har udviklet en Lære om Christi Legemes Ubiqvitet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에 대한 교리가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루터교의 “편재설(Ubiquitetslære)”, 곧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나 임재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리킵니다. 이 교리는 루터교 전통에서 발전된 것으로,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임재하며,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동시에 땅에서도 성찬의 요소들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 신학적 배경
- 이 교리는 communicatio idiomatum(속성 교통) 교리에 기반합니다. 이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단일 인격 안에서 결합되어, 신적 속성이 인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 그에 따라 루터는, 예수의 인성조차도 “원한다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 속에 “그의 참된 몸과 피”가 “in, cum et sub”—즉 안에, 함께, 아래에 임한다고 주장합니다.
- 루터는 이를 통해 가톨릭의 화체설(transsubstantiatio), 츠빙글리의 기념설, 칼뱅의 영적 임재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실재 임재론(Realpræsens)**을 확립합니다.
📚 문헌적 근거
- 이 교리는 루터파 최후의 신조 문서인 **《Formula Concordiae》(1577–78, ≪일치신조≫)**에서 결정적으로 정리되며,
- 제7조 “성찬에 대하여” 항목의 Solida Declaratio 7.4와 7.35 등에 상세히 언급됩니다.
- Karl Hase의 ≪Hutterus redivivus oder Dogmatik≫ §123(1837)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요약하며,
- 다음과 같은 핵심 문장을 포함합니다:
“브레드와 와인은 남아 있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인간적 본성에 따라 원하시는 곳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며, 그는 외적 표징 안에서, 함께, 그 아래에 자신의 참된 몸과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전달하신다.”
- 키르케고르는 H.N. Clausen의 조직신학 강의 노트(SKS 19, 44f.)에서도 이 논의를 주석하며 비판적으로 인용합니다.
❗ 키르케고르의 비판적 입장
키르케고르는 이 ubiquitetslære를,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실존적 긴장 속에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정당화하여 실족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의 말씀은 믿을 것인가, 실족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역설적인 실존의 자리여야 한다.
- 그러나 편재설은 이를 하나의 교리적 안전망으로 삼아, 실존적 결단 없이도 신앙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낳는다.
- 결과적으로 기독교 사회의 성례전 이해는 실족의 구조를 제거하고 감상적 교리로 전락한다.
성찬 관련 신학 개념 비교
🕊️ 성찬론 비교표: 로마 가톨릭 vs 루터 vs 츠빙글리 vs 칼뱅
| 구분 | 로마 가톨릭 (화체설) | 루터 (실재 임재 & 편재설) | 츠빙글리 (기념설) | 칼뱅 (영적 임재설) |
|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 | 변화(transsubstantiatio)– 빵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됨 | 실재 임재(real presence)–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실제로 현존함 | 기념(symbol)– 성찬은 단지 상징적 기념 행위 | 영적 임재(spiritual presence)–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실제 연합되지만 물리적 임재는 아님 |
| 신학적 기초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 구분 (형상은 유지되며 질료는 변함) | communicatio idiomatum– 신성과 인성 간 속성 교류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 가능함 | 상징주의적 성경 해석– 요 6장은 비유적 언어 | 성령의 중재를 통한 신앙적 참여– 물리적 변화 없음 |
| 신자의 수용 여부 | 믿는 자만 유익– 그러나 실체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짐 | 믿든 안 믿든 모두 수용함– 하지만 믿는 자만 유익하게 됨 | 기억과 감사 중심– 수용 여부는 내면적 태도에 달림 | 믿음 있는 자에게만 영적 임재 |
| 목적과 기능 | 속죄 은총의 재현 및 은혜 수여 행위 | 은혜의 수단, 죄 사함과 믿음 강화의 통로 | 공동체적 기억과 신앙 재확인 | 신앙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연합 강조 |
| 실족 가능성 (SK적 관점) | 신비성 강조로 실족의 긴장은 간접적으로 유지 | 실존적 실족 제거됨– 교리화와 편재설로 역설적 구조 무마 | 실족 없음 – 인간 중심 해석으로 역설 구조 사라짐 | 실존적 결단 여지 있음– 그러나 여전히 논리적 구조 우위 |
🧩 키르케고르의 비판 핵심 (요약)
- 루터: 기독교 사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ubiquitetslære’로 체계화함으로써 “실족의 가능성 없이 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함.
- 츠빙글리: 그리스도의 실재를 제거한 채 기념적 의미만 강조함으로써 역설 자체를 지움.
- 칼뱅: 비교적 균형 잡힌 시도지만, 여전히 실존적 긴장보다는 교리적 논리가 앞섬.
- 가톨릭: 신비주의적 요소가 실족의 구조를 감싸 안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된 형이상학적 설명으로 인해 실존의 결단은 약화됨.
📌 결론
키르케고르에게 있어 성찬은 단순한 기억이나 은혜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말씀하신다”는 역설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발생하는 자리이다. 즉,
“당신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는가?” “그 앞에서 믿겠는가, 실족하겠는가?”
그 선택의 실존적 결단이야말로 진정한 성찬의 자리이며, 그 자리는 어떤 교리 체계로도 포획될 수 없는 고난의 신비이자 믿음의 격렬한 순간이다.
'다섯 번째 시기의 작품 > 기독교의 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독교의 훈련 2부 B의 첨언 해설, 영역본 102쪽 (0) | 2025.05.16 |
|---|---|
| 기독교의 훈련 (0) | 2025.05.16 |
| 기독교의 훈련, 모토 해설 (1) | 2025.05.16 |
| 기독교의 훈련, 모토 해설 (0) | 2025.05.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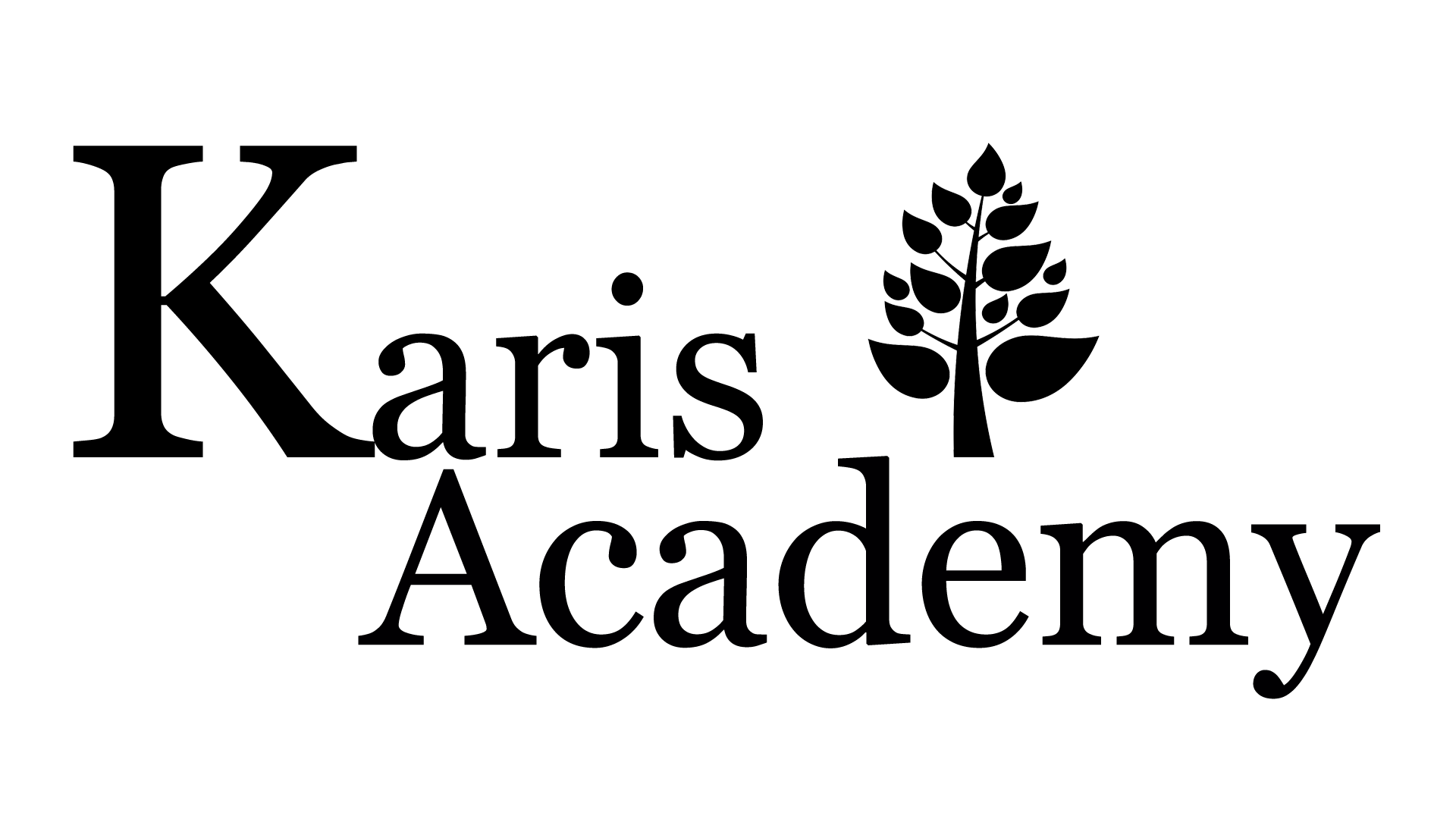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