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 글은 컴퓨터나 패드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제4장의 첫 문장은 “시가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두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두 원인은 첫째, 지식이란 인간의 모방능력에 근거한다는 것, 둘째, 모든 인간이 모방된 것에 대하여 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모방에 의해 지식을 습득하며 모방된 것에 대해 쾌감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있다.[#보기1 Aristoteles,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이하 《시학》이라 표기함), 서울 2006, 49쪽 참조.] 만약 어떤 그림을 보고 우리가 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그림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보기 흉한 동물이나 시신의 모습처럼 실물을 볼 때에는 불쾌감을 야기할 대상이라도 그것이 매우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면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보기2 《시학》, 37쪽 참고] 나아가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비극에서 비극적 주인공의 고통도 우리에게는 쾌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비극은 인간의 행동, 생활, 행복과 불행의 모방을 통해 어떤 고통이 실제의 사람에게 닥쳤을 때 어떠할 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때문이다.[#보기3 《시학》, 51-52쪽 참고]
따라서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쾌감이란 모방에 그 근거가 있으며,이 모방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미메시스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얻는 쾌감은 바로 미메시스에 의해 발생하는 쾌감이다. 이 미메시스의 쾌감은 인식적 과정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미메시스는 학습과 쾌감의 바탕이 된다.[#보기3 Matthew Potolsky, Mimesis, Routeledge, New York and London, 2006, p.37 참조. 프로이트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 향유의 토대가 ‘재인식에서의 기쁨’(Freude am Wiedererkennen)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Sigmun Freud, Der Witz und seine Beziehung zum Unbewußten (1905), 임인주 옮김,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파주 2007, 158쪽.]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술작품을 통해 얻는 쾌감이 미메시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식적인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때 예술작품은 미메시스, 즉 모방을 통해 어떤 대상을 재현(representation)한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또한 그 이전의 플라톤에서) 그 연원을 가지는 미메시스는 어떤 예술작품이 대상을 재현하는 토대가 된다. 다시 말해 예술작품은 미메시스적 기능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를 재현한다.[#보기4 이와 관련하여 매튜 포톨스키(Matthew Potolsky)는 미메시스의 세 양태를 수사학적 모방, 극적 모방, 리얼리즘으로 나누고 있다. Matthew Potolsky, 앞의 책, p.96 참조.] 그런데 재현의 토대가 미메시스, 모방또는 모사라면 어떤 사물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예술작품은 그 재현대상을 닮아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현대상과 재현된 것으로서의 예술작품의 유사성 때문에 어떤 예술작품은그것이 모방하는 자기 바깥의 실제 대상을 지시(reference)하고 있다. 이것은 회화예술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회화예술의 재현적 특징은 언어예술에서도 인과적인 플롯의 구성과 대상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하는 재현적 서사로 나타난다.[#보기5 한편 넬슨 굿맨은 유사성에 바탕을 둔 단순한 모방과 회화적 재현을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효과적인 재현과 묘사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창조를 요구한다. 효과적인 재현과 모방은 창조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상을 형성하고 관계짓고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이와 같이 예술과 담론의 산물이다. Nelson Goodman, Languages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The Bobbs-Merrill Company, Indianapolis 1968, p.31 참조.]
그런데 앞 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다시피 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이러한 재현적 예술은 막을 내리고 예술작품들은 비재현적 양식을 취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예술작품은 자신바깥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적 성격을 잃고 단지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자기지시성(self-referentiality/Selbstreferentialität)만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대상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이러한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재인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예술작품은 자기 지시적인 어떤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술사에서 “재현의 종언”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의 주제와 연관하여 이것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19세기에 들어와 그림보다 더 대상을 잘 모사하는 사진과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회화는 자신의 특성과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강요받는다고 파악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재현을 포기하는 모더니스트 회화의 특징을 ‘평면성’(flatness)이라고 지적하며, 그에 따르면 모더니즘 회화, 현대회화는 회화적 표면의 점진적인 평면화를 추구하며 이제 현대 회화에서는 구상적인 형태와 내용이 사라진다. 이러한 경향은 마네(Edouard Manet, 1831-1883)의 작품들에서부터 시작한다.[#보기6 Charles Harrison, Modernism, 정무정 옮김, 《모더니즘》, 열화당, 파주 2003, 19-22쪽 참조. 그리고 Arthur C. Danto, After the End of Art: Contemporary Art and the Pale of History, 이성훈·김광우 옮김, 《예술의 종말 이후》, 미술문화, 서울 2004, 145-146쪽 참조. 한편 단토는 평면성이 재현을 추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차원 공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환영을 추방하는 것으로 본다. 단토의 이 말은 재현을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앞 각주를 참조하라. 그러나 좁은 의미의 재현은 2차원의 화폭에 3차원의 입체감을 드러내도록 대상을 모사하는 환영주의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재현’이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미메시스, 모방, 모사라는 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술사적으로 ‘재현’을 문제삼을 때 출발점은 재현대상과 재현된 것으로서 예술작품 사이의 ‘유사성’과 그에 기초한 지시(reference)관계가 ‘재현’과 ‘비재현’을 가르는 기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현대미술이 추구한 평면화는 현대미술이 재현의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질문한 이후의 결과물이며, 이어서 이 결과는 예술작품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예술작품이 더 이상 대상을 지시하지 않게 된다면 예술은 인식적 목적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더 나아가 도덕적 목적과 연결된 정치적 의도로부터도 독립하게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닌 칸트의 형식주의 미학에 바탕을 둔 것이며 따라서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회화론은 형식주의 모더니즘으로 귀결된다.[#보기7 그런데 모더니즘 미술의 두 큰 경향은 이 ‘형식주의 모더니즘’과 형식주의 모더니즘에서 생긴 삶과 예술의 분리에 저항하여 그것을 다시 결합하고자 하는 ‘역사적 아방가르드’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기의 앞의 글, 209쪽 이하를 참조하라.] 그린버그는 이러한 모더니즘 회화가 회화의 평면성을 솔직하게 선언한 마네의 회화로부터시작하며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21-1956)의 추상표현주의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고 본다.[#보기8 Pam Meecham, Julie Sheldon, Modern Art: A Critical Introduction, 이민재·황보화 옮김, 현대미술의 이해, 시공사, 서울 2008, 33쪽, 그리고 Clement Greenberg, Art and Culture, 조주연 옮김, 예술과 문화, 경성대학교 출판부, 부산 2004, 346쪽이하 참조.]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린버그는 이 모더니즘 회화가 더 이상 대상지시성(Objektreferentialität)을 상실하여 자기지시적이 되고 주제보다는 형식에만 집착하기때문에, 재현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주제에 따른 내용성을 추구하거나 ‘삶과 예술의 분리’를 ‘지양’하고자 하는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팝아트 등은 배격한다는 사실이다.[#보기9 Pam Meecham, Julie Sheldon, 같은 책, 55쪽, Clement Greenberg, 같은 책, 79쪽, Arthur C. Danto, 같은 책, 24쪽 참조.]
그런데 이 글에서 문제삼고 있는 미장아빔은 예술작품의 자기지시성, 자기반영성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미장아빔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한다면 전통적 재현의 원리를 고수하고자 하거나 그로 인해 대상지시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작품은 미장아빔의 자기지시성, 자기반영성을 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예술의 종말’을 설파하는 단토(Arthur C. Danto, 1924-2013)의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단토는 1964년에 제작된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브릴로 박스>를 기점으로 예술은 종말을 맞이하였다고 선언한다. 단토는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부정하며 예술사를 첫째, ‘예술이전의 시대’(고대-1400년), 둘째, ‘예술의 시대[거대 내러티브/거대 서사 시대]’(1400-1960년 중반), 셋째, ‘역사 이후의 시대’(예술이 종말을 고한 1960년 중반 이후)로 나눈다. 그리고 다시 ‘거대 내러티브 시대’를 모방과 재현에 집중한 바자리 에피소드(1400-1900년)와 재현의 포기 및 모더니즘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그린버그 에피소드(1900-1960년 중반)로 나눈다.[#보기10 Arthur C. Danto, 앞의 책, 40, 116, 140, 191, 212, 241쪽 참조.] 그런데 단토는 이 두 에피소드는 모두 ‘예술이란 어떠한 것’이라는 특정한규범을 강요하기 때문에 ‘거대 서사’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알다시피 ‘거대 서사’란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 1924–1998)가 역사의 진보와 같이 세계, 역사 또는 사회에 대한 대규모의 총체적 설명,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편적 원리, 사물들의 공통적 본질, 보편적 진리 등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이다.[#보기11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유정완 외 옮김, <포스트모던의 조건>, 민음사, 서울 1992, 33-34쪽.] 단토는 ‘평면성’을 모더니즘 회화를 아우르는보편적 기준으로 삼은 그린버그식 모더니즘론은 거대 서사이며, 따라서 ‘독단주의’이며 ‘비관용’적인 것이라고 보았다.[#보기12 Arthur C. Danto, 앞의 책, 150-151쪽.] 다시 말해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모더니즘론은 모더니즘의 비재현주의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 이데올로기(평면성)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아직 거대 서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보기13 그리고 여기서 (그린버그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장아빔은 예술의 자기반영성, 자기지시성을 구현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그린버그는 모더니즘의 성공을 ‘자기비판의 성공’이라고 한다. Clement Greenberg, 앞의 책, 346-347쪽 참조. 한편 거대 서사를 비판하는 리오타르에게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의 모던 작품은 그가 자신의 포스트모던 숭고론을 정립하는 바탕이 된다. 그의 말처럼 예술은 더 이상 모델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며,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연 또는 대상을 모방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현불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려 한다. Jean-François Lyotard, 앞의 책, 220쪽 참조. 이에 대해서는 또한 배철영,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던 미술론 — 숭고의 미학,차이의 존재론 그리고 비판」, <철학논총> 제27집, 제1권, 새한철학회, 2002, 119쪽 이하를 참조하라.]

이러한 거대 서사, 특히 그린버그의 거대 서사를 무너뜨린 것이 워홀의 <브릴로 박스>이다. 워홀의 <브릴로 박스>(1964)는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샘>(1917)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뒤샹이 공장에서 출시된 소변기에 화장실 설비 제조회사(Mott Works)의 이름을 살짝 바꾼 사인(R. Mutt)을 하여 전시하였다면, 워홀은 슈퍼마켓에 진열된 세제 ‘브릴로’의 박스와 똑 같은 크기의 나무박스를 수백 개 제작하여 이것들에 실크스크린으로 ‘브릴로’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여 붙여서 뉴욕의 화랑에 전시하였다. 따라서 워홀의 <브릴로 박스>는 뒤샹의 <샘>의 의도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기성품이나 공산품(뒤샹), 또는 외관상 그것과 구분이 불가능한 것(워홀)을 미술관에 전시함으로써 예술작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이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단토는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예술의 종말’을 고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보면서 이질문에 대답한다. 통상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술작품인지 아닌지, 또는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술작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대의 예술작품은 그저 보아서는 왜그것이 예술작품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따라서 현대의 예술작품은 왜 그것이 예술작품이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던진다.[#보기14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맨 아래 타타르키비츠에 대한 글을 참고하라.] 왜냐하면 워홀의 <브릴로 박스>는 시각적으로실제의 세제 ‘브릴로’ 박스와 전혀 구분되지 않음에도 예술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각, 나아가 지각적 속성은 아무런역할을 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감각 또는 지각에 기초한 경험에서 사고(thought), 즉 철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보기15 Arthur Danto, 앞의 책, 59쪽 참조.] 왜냐하면 우리는 사유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예술작품으로 전시하는 어떤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며, 그로써 어떤 의미를구현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보기16 Arthur Danto, 앞의 책, 354쪽 참조.]
따라서 우리는 지각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시되는 어떤 것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고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단토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예술작품이란 구현된 의미이다.”[#보기16 Arthur Danto, 같은 책, 197쪽.]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단토의 문제의식을 지시성의 문제와 연관시켜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워홀의 작품 <브릴로 박스>는 지시성의 문제에서 더 고도화된 문제를 유발시킨다. 워홀의 작품 <브릴로 박스>는 실제 사물(실제의 세제 ‘브릴로’ 박스)과 시각적으로 전혀 구분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의 슈퍼마켓에 있는 ‘브릴로’ 박스들을 지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 그것은 대상을 지시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것인가? 여기서 그 대답은 유동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실제의 ‘브릴로 박스’를 지시할 수도 있고(대상지시성), 그와 무관하게 그저 자기 자신 만을 지시할 수도 있다(자기지시성).
이에 대한해석과 수용은 열려 있다. 여기서 <브릴로 박스>의 예술작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현’과 관계되는 대상지시성에 있지 않고 나아가 ‘비재현’적 자기지시성에 있지도 않다. 그런데<브릴로 박스>같은 작품이 만약 과거에 만들어졌다면 예술작품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술사적 맥락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작품 속에서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 누구에 의해 그 정체성이 변용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수용될 때 그 어떤 것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보기17 이성훈, 「<브릴로 박스>는 예술의 종말을 신호하는가? -앤디 워홀과 단토의 헤겔주의」, <미학·예술학연구> 제16집, 한국미학 예술학회, 2002, 166쪽 참조. 또한 이때 어떤 것이 구현하는 의미를 포착하여 그것을 예술작품이게끔 하는 것이 ‘예술계’이다.]
이렇게 예술작품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수용자의 의미부여가 중요하게 됨으로써 예술작품은 지시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한다. 이로써 ‘예술의 종말’이 초래된다. 그런데 단토의 이 말은 예술이 끝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술 또는 예술작품을 규정하는 하나의 서사(여기서는 거대 서사)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기18 Arthur Danto, 같은 책, 41쪽 이하 참조.] 말하자면 우리의 동시대는 어떤 대상을 ‘재현’하거나 내면의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는 형식상 ‘평면성’과 같은 보편적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을 예술작품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브릴로 박스>는 눈에 보이는 지각적 속성이 예술작품의 자격 기준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술작품을 보는 특정한 방식이 사라졌다. 이후로는 예술이 취할 수 있는 특수한 역사적 방향이 있을 수 없다.[#보기19 이성훈, 앞의 글, 169쪽 참조.] 이제 예술작품은 그것의 예술작품 여부를 규정하는 외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난다. 그리하여 작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다원주의 또는 관용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어떤 것이든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어떤 것이 ‘무엇’에 관한 것으로서 존재하며 그럼으로써 의미를 가진다면 그 어떤 것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또 ‘예술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시성과 관련하여 다시 말해본다면 예술작품은 그 어떤 지시성(그것이 대상 지시성이든 자기지시성이든)으로부터도 벗어남으로써 자유를 획득하게 되며 또 그로부터 해석의 자유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소비문화의 여러 상품을 작품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앤디 워홀의 대중주의 및 팝아트가 순수예술과 상업예술,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이라는 경계를 없애버리고 예술작품의 해석과 수용을 깊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미술사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우리의 주제, 미장아빔으로 다시 돌아가자.
# 참고자료: 타타르키비츠
타타르키비츠(Władysław Tatarkiewicz, 1886-1980)는 예술을 “미의 생산”과 “자연의 모방”으로 정의하는 전래의 정의방식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예술을 인간의 다른 의식적 활동과 구분해주는 특징을 통해 예술을 정의내리는 모든 이론을 검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의 정의는 ①미의 생산, ②현실의 재현 또는 재생산, ③형식의 창조, ④표현, ⑤미적 경험의 산출, ⑥충격이라는 여섯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모든 예술을 아우르는 보편적 정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예술의 정의’는 포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최근류개념과 종차를 통한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의방식이 아닌, 따라서 선언명제의 조합을 통해 ‘예술의 정의’를 시도하자고 권유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사물을 재현하거나 형식을 구성하거나 경험을 표현하는 의식적인 인간활동이며 그러한 재현이나 구성이나 표현의 산물은 기쁨이나 감정이나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예술작품은 사물의 재현이나 형식의 구성이나 경험의 표현이며 기쁨이나 감정이나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Władysław Tatarkiewicz,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이용대 옮김,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서울 1990, 39-52쪽.
그리고 디키(George Dickie, 1926년생)도 어떤 것을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경험적 체계로서 ‘예술계’(art world)의 존재를 가정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세기까지 대표적인 예술론은 모방론과 표현론이었다. 이들 이론은 ‘모방’과 ‘표현’을 각각 모든 예술의 공통적 속성이라고 보면서 어떤 예술작품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술작품은 어떤 것을 모방하여 재현해주거나 내면의 정서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전통적인 본질주의적 관점에서의 예술론이며, 디키는 이와 달리 분류적 의미의 예술론을 내세운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예술작품에서는 그저 보아서는 그것이 예술작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예술작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분류적 의미가 필요하다. 이 분류적 의미에서 예술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인공성’(artifactuality)와 ‘감상의 후보로서의 자격’이다 (George Dickie, “Defining Art”, in American Philosophical Querterly, Vol. 6, No. 3,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9, p.254. 이때 ‘인공성’은 사람에 의해 물리적으로 가공된 자연물 또는 인공물 뿐 아니라, 뒤샹의 <샘>처럼 예술가에 의해 예술이라고 간주되어 전시되는 것, 즉 전시회라는 새로운 맥락에 놓이는 것도 의미한다. 그리고 ‘감상후보로서의 자격수여’는 예술작품을 제도적 존재로 취급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즉 어떤 것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술작품이라고 인정하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따라 어떤 것이 예술작품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경험적 체계로서의 ‘제도’가 ‘예술계’(artworld)이다. 다시 말해 예술계란 “어떤 대상에게 감상을 위한 후보자의 자격을 수여하는 구성원들로 조직된 사회제도”이며, 또한 “예술작품이 생산되고 향유되는 광범위한 사회제도”이다. (장민한, 「미술비평에서 ‘예술계’의 역할 –아서 단토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학>, 제55집, 한국미 학회, 2008년, 122-129쪽 참조).
출처: 김종기, "예술 작품에서 지시성의 문제, 예술작품 속의 미장아빔 기법과 데리다의 문제의식," 세한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4, 29-45.
'문화&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반복과 차이의 문제 (0) | 2022.02.26 |
|---|---|
| 예술작품의 자기반영성 및 자기지시성과 미장아빔 (0) | 2022.02.23 |
| 미장아빔 요약 (0) | 2022.02.21 |
| 미장아빔(Mise en abyme) (0) | 2022.02.21 |
| 정규 표현식(Regular expression) (0) | 2020.09.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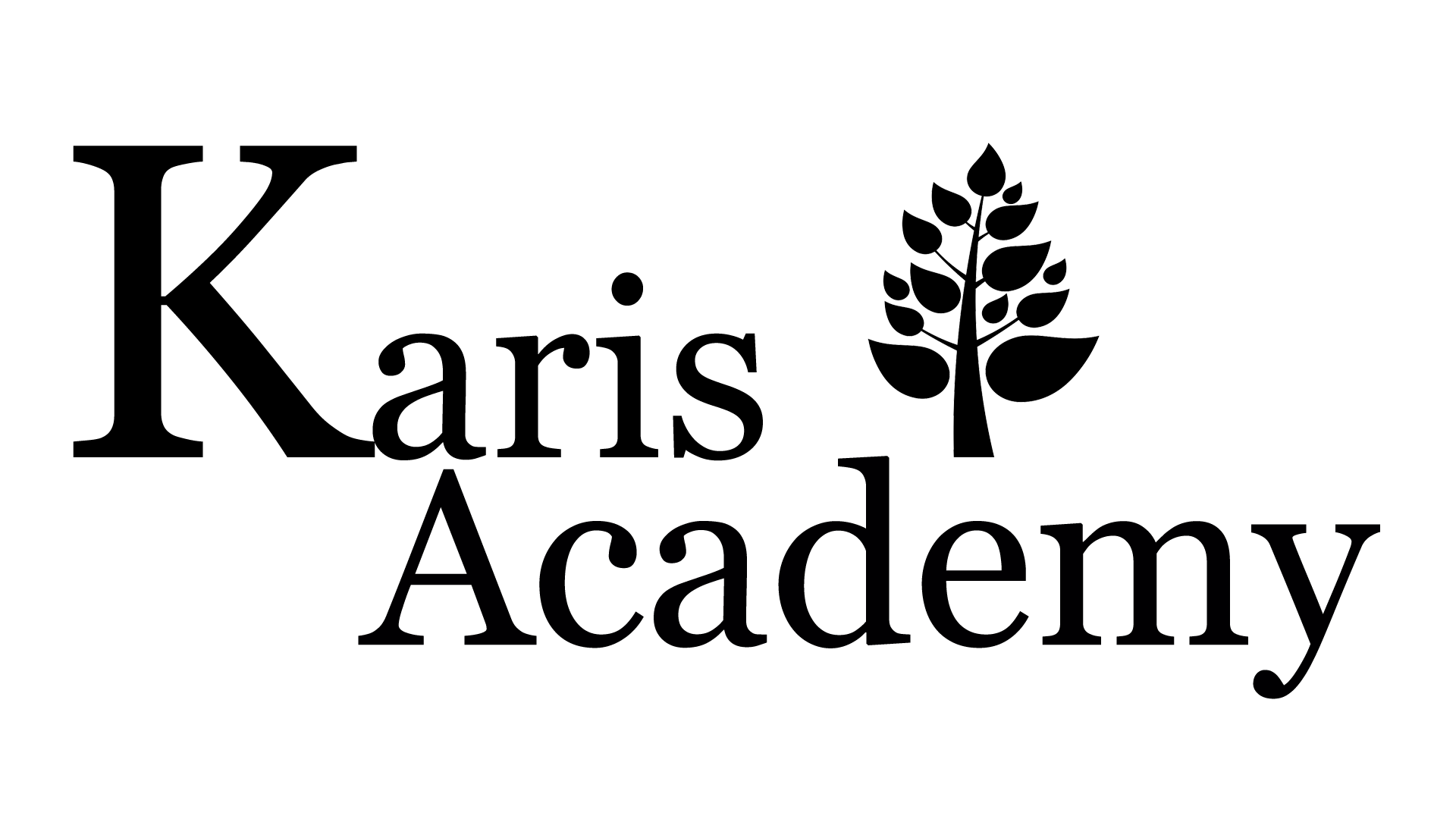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