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케고르가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부자유(Ufrihed)가 단순한 수동적 상태가 아니라, 자유(Frihed)와 깊이 연결된 능동적 현상(Phænomen)이라는 점”이다. 즉, 부자유는 자연적 필연성(Naturkategorier)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실존적 상태이다. 이 점을 놓치면, 키르케고르의 논리를 오해할 수 있다.
1. 부자유(Ufrihed)는 자유(Frihed)의 현상이다.
보통 우리는 부자유를 자유의 부재(absence of freedom)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부자유가 단순한 결핍 상태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현상(Phænomen)이라고 주장한다. 즉, 부자유는 자유가 부정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왜곡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법칙이나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자유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2. 부자유는 자기 부정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키르케고르는 부자유를 가진 존재가 때때로 “나는 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거짓(Usandhed)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설령 “나는 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부자유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다. 자유의 본질이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이라면, 부자유는 “스스로를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것(Det Dæmoniske)”과 연결된다. 자유가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할 때, 인간은 악마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유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자유”이다.
3. 부자유의 기만성: 부자유는 “자신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원하고 있다.”
부자유는 “나는 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유지하려는 더 강한 의지”가 존재한다. 이 모순 속에서, 부자유는 자신이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믿지만, 사실상 여전히 선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기만적 속성이 부자유의 핵심이다.
4. 실천적 함의: 왜 젊은 시절에 이 논의를 실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가?
키르케고르는 이런 실존적 논쟁이 사람을 절망(Fortvivlelse)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부자유의 기만성을 논박하면서 논리를 전개할 경우, 그 논리에 갇힌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실존적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유의 개념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부자유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존적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실험적으로 다루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자유와 부자유의 문제는 단순한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실존적 삶 전체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정리
👉 부자유는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왜곡된 자유이다.
👉 부자유는 자기 부정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유지하려는 상태이다.
👉 이러한 부자유의 기만성은 사람을 실존적 절망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단순한 실험적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신학과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어떻게 볼 것인가? (0) | 2025.03.18 |
|---|---|
| 악과 죄의 근본적 관계는? 불안의 개념 4장 (0) | 2025.03.18 |
| 불안의 개념 4장 아이러니 해설 (0) | 2025.03.17 |
| 헤겔과 아이러니, 불안의 개념 4장 (0) | 2025.03.17 |
| 불안의 개념 "계시" 번역어 문제 (0) | 2025.03.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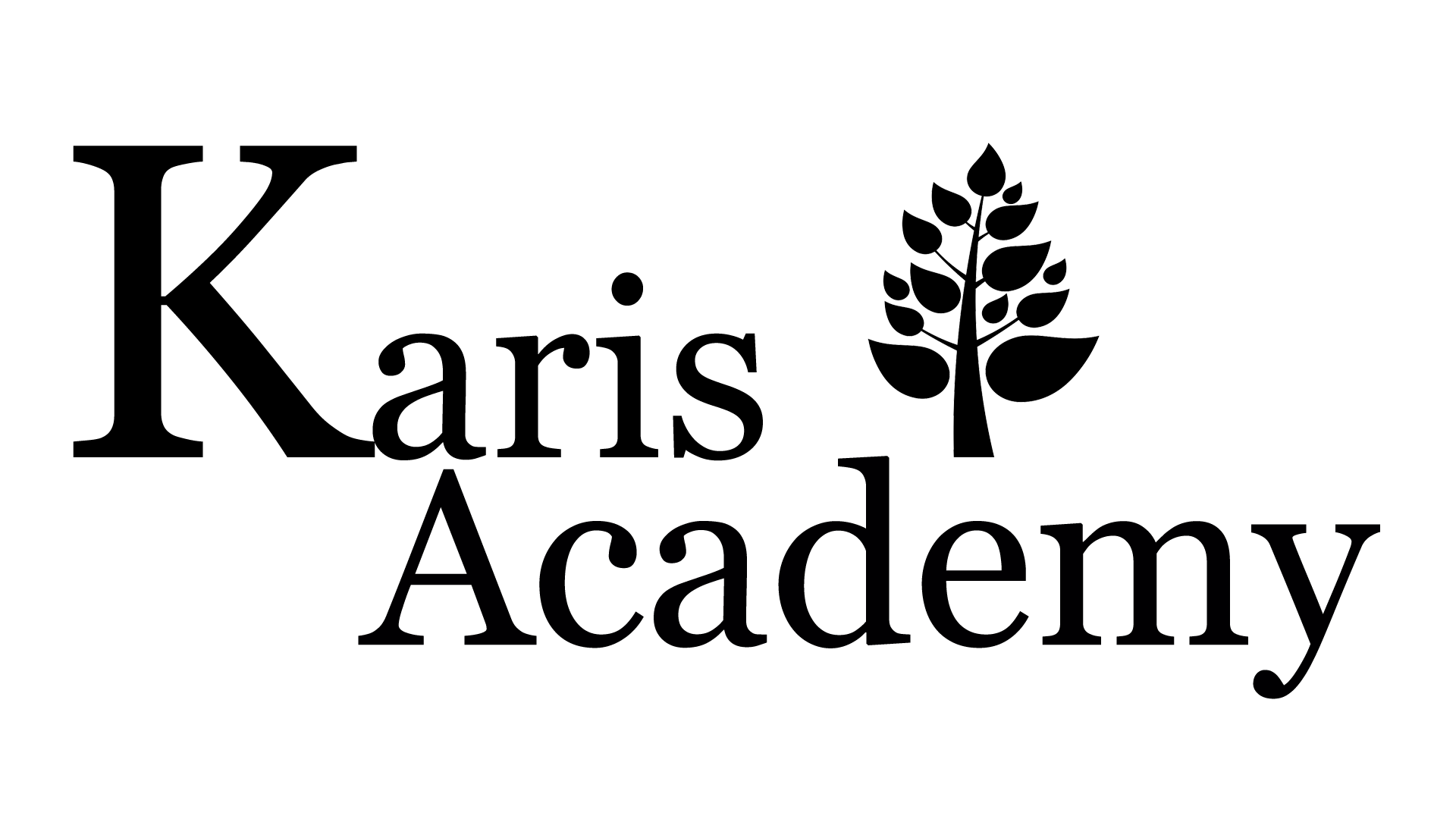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