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onie … Eftersnakkerne … verdenshistoriske Oversigt … om Begreberne :
이는 H.L. 마르텐센(H.L. Martensen)의 논문 『파우스트 개념에 대한 성찰: 레나우의 파우스트를 중심으로(Betragtninger over Ideen af Faust. Med Hensyn paa Lenaus Faust)』(『Perseus』 1호, p. 90-164)에서 아이러니와 세계사적 개관(verdenshistoriske Oversigt)에 대한 논의를 가리킨다.
1. 마르텐센의 논점: 아이러니와 파우스트
마르텐센은 “묵시록적이고 절대적인 시(poesis)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세계사적 시대(verdenshistoriske Epoker)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형태를 거쳐왔다”고 주장한다. (p. 98ff.) 그는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Faust)』를 비판하며, 이를 “범신론적 세계관(panteistiske verdensforståelse)” 속에 속하는 작품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는 단순히 ’아이러니의 대표자(Ironiens Repræsentant)’로 축소되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p. 122.)
• 괴테의 메피스토펠레스는 단순한 냉소적 아이러니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 그리고 파우스트의 노력조차 “정교한 세속적 이성의 냉소적인 조롱(fine Verdensforstands bidende Spot)“으로 축소된다.
또한 니콜라우스 레나우(Nikolaus Lenau, 1802-1850)의 『파우스트(Faust)』(1836)에 대한 분석에서, 마르텐센은 레나우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하며 “날마다 아이러니 속에서 발전한다(Dag for Dag gjør Fremskridt i Ironien)“고 평가한다. 그는 레나우의 작품이 파우스트를 “시적 풍자가(poetisk Satiriker)“로 등장시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단순한 풍자(satire)와 더 깊은 아이러니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아이러니(Ironie)는 영원의 핵심을 품고 있는 깊은 차원의 것이다.”
• “신적 아이러니(guddommelig Ironie)는 세계의 어리석음과 헛됨을 초월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그러나 단순한 풍자는(den blot Satiren) 단순한 부정(Negativitet)이며, 전적으로 메피스토펠레스적(mephistopheliske Præg) 성격을 지닌다.” (p. 138.)
2. 키르케고르의 비판적 맥락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마르텐센의 논의 방식과 그가 아이러니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 인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특히 “아이러니를 세계사적 개관(verdenshistoriske Oversigt) 속에서 다루는 태도”를 비판하고, 이를 “아이러니에 대한 피상적인 반복적 논의(Eftersnakkerne)로 변질시키는 철학적 경향”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즉, 키르케고르는 아이러니를 단순한 역사적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을 경계하고, 소크라테스(Socrates)에서 시작된 실존적 의미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 있다.
https://youtu.be/f72Dw1VftOk?si=ApS6E189GFZMChVX

'신학과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유와 부자유의 관계 (0) | 2025.03.18 |
|---|---|
| 악과 죄의 근본적 관계는? 불안의 개념 4장 (0) | 2025.03.18 |
| 헤겔과 아이러니, 불안의 개념 4장 (0) | 2025.03.17 |
| 불안의 개념 "계시" 번역어 문제 (0) | 2025.03.17 |
| 키르케고르와 무의식 (0) | 2025.03.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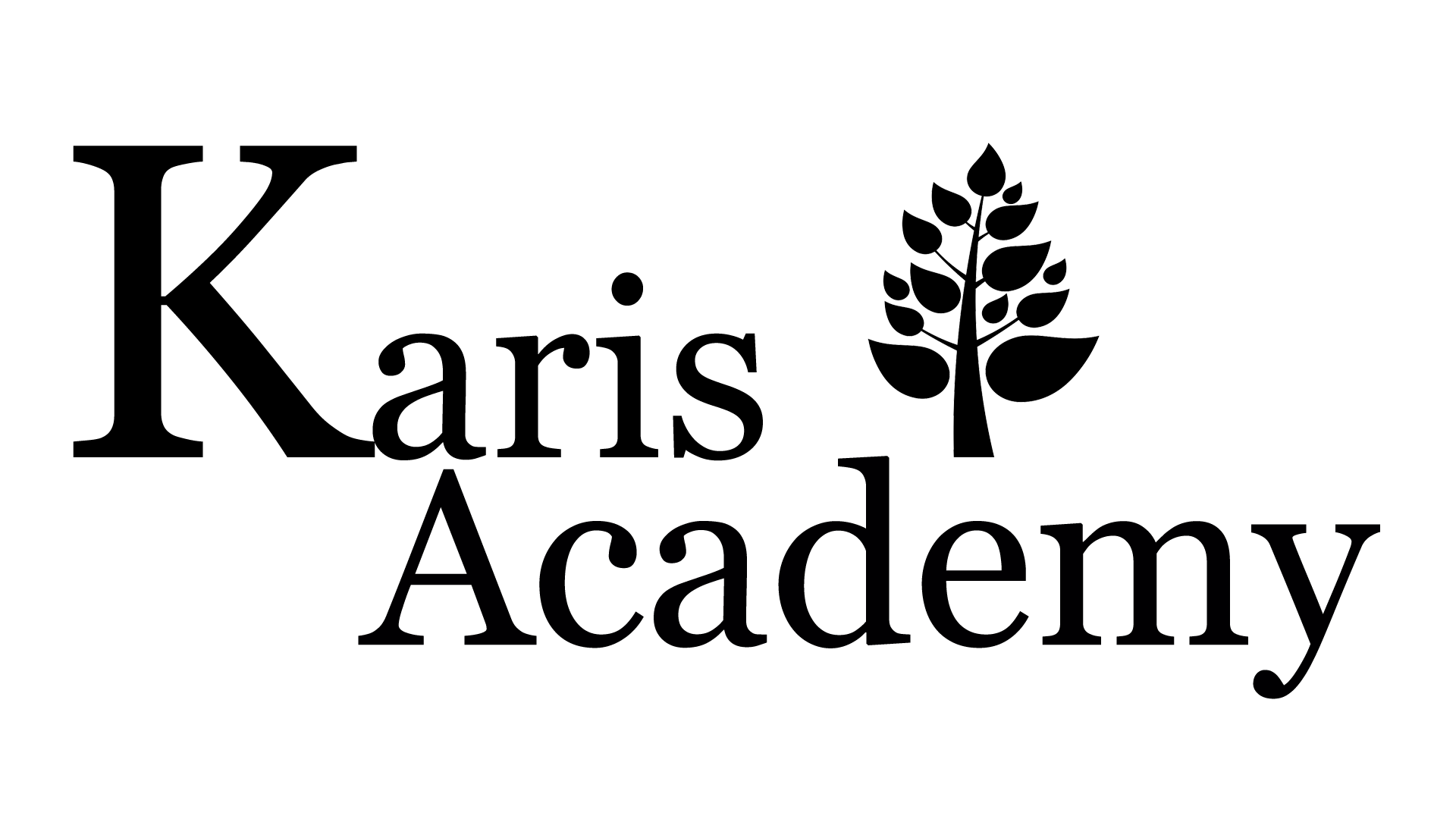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