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맥에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이방인(hedningen)이 인간의 육체적 영광에 대해 가장 완전하게 말했을 때조차 여전히 불완전했다”고 할 때, 그가 염두에 둔 대표적인 인물은 플라톤 또는 플라톤적 전통에 선 스토아주의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인물은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나오는 케베스(Kebes)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문맥적 단서: “육체적 영광에 대해 가장 완전하게 말한 이방인”
이 표현은 바로 앞서 당신이 인용하신 키르케고르의 주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en Hedning … Sjelen … liig en Væver … Paaklædning : sigter til en udtalelse af Kebes i Platons dialog Faidon (87b-e)…
즉, 키르케고르 자신이 직접 플라톤의 ≪파이돈≫ 87b-e에서 케베스의 비유를 언급하고,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직조공과 옷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방인의 철학적 사유를 인용합니다. 케베스는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의심하면서도 **육체를 “영혼이 계속 새로 짓는 옷”**에 비유하며, 상당히 미묘하고 철학적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육체의 중요성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육체의 영광에 대해 가장 완전하게 말한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철학적 범주에서 보면: 플라톤과 스토아철학자들
그러나 보다 넓게 보면, 키르케고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방인의 범주는 다음과 같은 철학자들일 수 있습니다:
• 플라톤: 영혼의 불멸성과 육체의 기능, 이상적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논함.
• 스토아철학자들: 인간의 이성(logos)을 강조하며,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육체-정신 통일성 속에서 표현.
•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형상(form)*으로서의 영혼 개념,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자 ‘이성적 동물’로 규정.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재현할 수 없는 존재”, 즉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인식하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신학적 선언이 지닌 실존적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키르케고르의 논지 요약
• 자연은 하나님을 상기시킬 뿐, 닮은 것은 아니다.
• 이방인은 육체와 영혼에 대해 철학적으로 정밀하게 논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신앙의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
• 따라서 이방인의 말은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불완전하다.
✅ 결론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육체적 영광에 대해 가장 완전하게 말한 이방인”은 구체적으로는 플라톤의 케베스, 더 넓게는 플라톤 철학 전체와 그 전통 속 이방 철학자들(예: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계시적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책소개 >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가 됨으로써 예배하는 자 되기, 149쪽 해설 (0) | 2025.04.09 |
|---|---|
| 우리가 기다리는 것, 148쪽 해설 (0) | 2025.04.09 |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0) | 2025.04.09 |
| 자연계시에 대하여, 146쪽 (0) | 2025.04.09 |
| 소크라테스가 얼굴을 가린 이유 (1) | 2025.03.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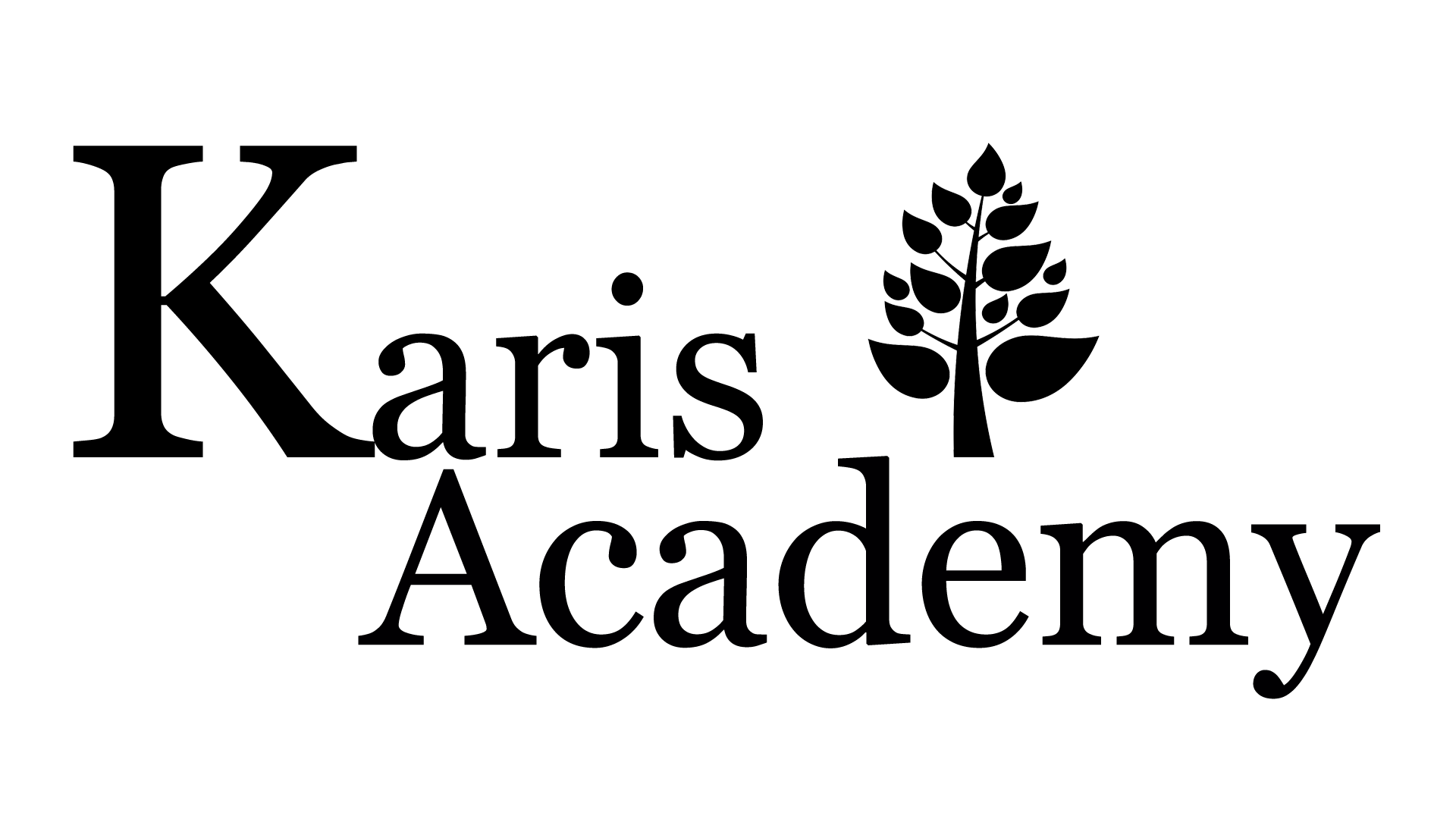
댓글